K-제조의 미래,
소부장으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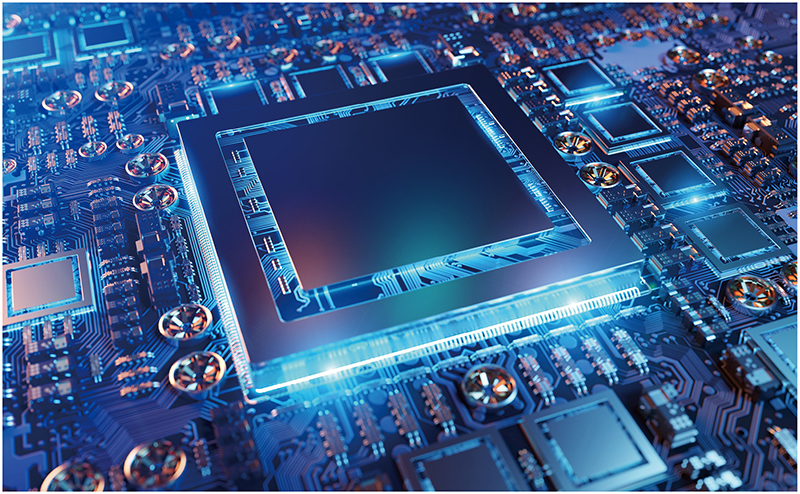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한국은 철광석을 수입하여 철강을 만들고, 원유와 나프타를 수입하여 레진(석화수지)을 만든다. 그리고 그 철강과 레진은 핸드폰, 자동차, 잠수함 등 거의 모든 제품의 Global Value Chain(이하 GVC)을 관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국부로 유입시키는 동맥이 된다.
한국 주요기업들의 GVC를 고찰해보면, 대체로 최상단(삼성전자 핸드폰,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대우 조선해양 잠수함)이나 최하단(포스코 철강, LG화학 레진)에 위치한 것에 비해 중간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딩이나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설계도 활발하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로 전례없이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리쇼어링 정책에서 경쟁력 강화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켰던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은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 생산 비중이 더 높다. 해외로 이전한 노동집약적 제조공정을 그대로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 공정에서 20명이 1분당 부품 1개를 생산하던 공정을 1~2명이 할 수 있도록 지능 자동화 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능 자동화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계공학적으로 속도를 높인 자동화 공정을 넘어서 센서, 비전, 그리고 그 신호의 분석을 통해 정밀함을 강구할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적용을 통해 한국 내 고용을 증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 GVC가 주로 제품 형태의 매출에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소부장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집중해 다양한 매출형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디지털 증폭력이 높은 플랫폼 활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 제조업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근면성실하게 빠르게 달려서 개도국 동종 산업 경쟁기업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충분한 인구성장과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베트남 등의 개도국, 제조업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 등의 동종 산업 기업들과 저부가가치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기존의 한국의 최고역량, 경험 자산을 기반으로 게임의 룰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기존에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창안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

글/박문구 전무
KPMG
서울대학교 국제경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통상전문가로서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자문했다. 현재는 한국 산업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디지털 혁신 등에 행동과학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