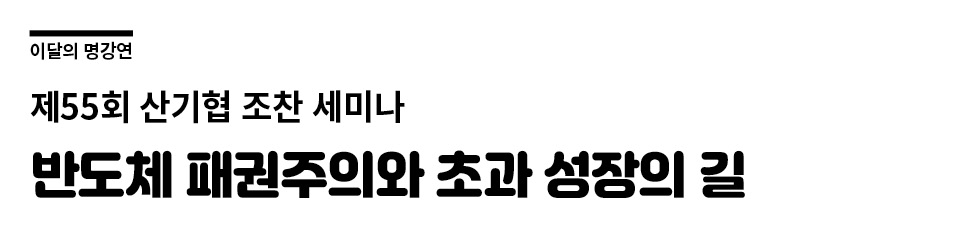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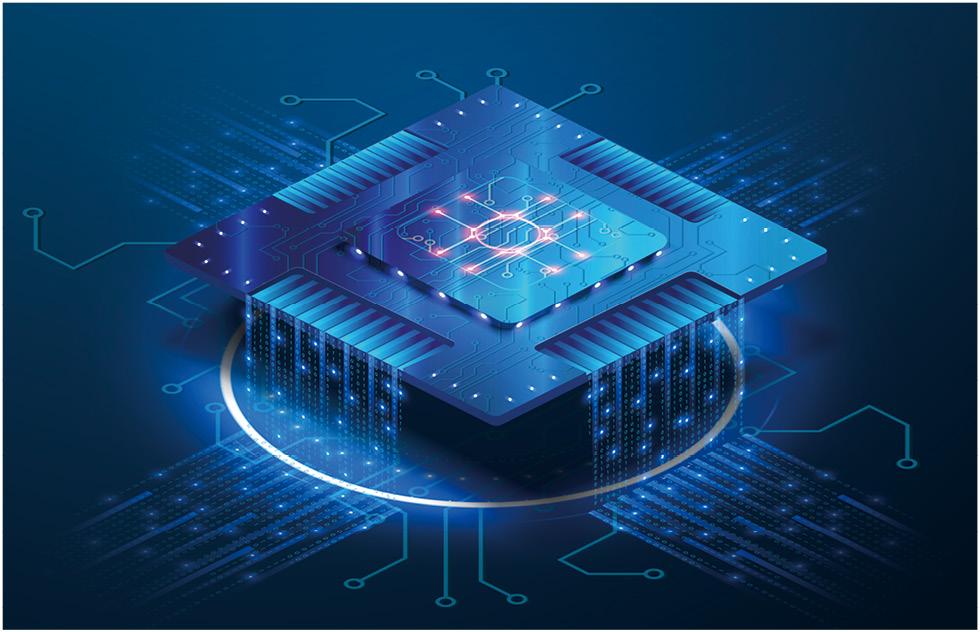
지난 6월 1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55회 산기협 조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강연자로 나선 노근창 현대차증권㈜ 상무는 코로나 이후 반도체 지역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며 이를 극복하고 초과 성장할 길을 함께 모색했다.
반도체 패권주의의 배경과 이유
2019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 상황에서 일본마저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한국은 반도체 패권주의의 실체를 목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세계인에게 각인한 계기였다. 미국은 현지에 반도체 공장 설립 시 1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투자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반도체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운드리(Foundry) 업체인 대만의 TSMC 역시 유럽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에는 인텔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공장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다수 반도체 공장들이 12㎚ 이하의 공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인텔 역시 10㎚ 이하의 반도체 공정이 없고, 시스크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첨단 공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향후 미래 자동차는 대부분 컴퓨팅 반도체를 탑재하게 되어 있다. 자율주행차, 로봇, 항공, 우주, 군수 등의 분야에서 5㎚ 이하의 RISC(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 방식의 AP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인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려면 웨이퍼(Wafer)를 가공해 완제품에 탑재할 수 있게 패키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미국에는 패키징 공장이 없어 결국 미국에서 생산한 웨이퍼 및 가공 칩은 아시아 에서 후공정을 거쳐야 한다.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높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생산 역량이 집중되어 있으면,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또한, 고객은 전력 소모가 적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면 수급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다. TSMC는 미국과 일본에 동시 투자에 나섰고, 주요 패키징 회사 생산 공장 역시 대부분 아시아에 있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겨냥해 20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공장 건설 및 신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했다. 이미 대만 UMC와 PSMC 등 몇몇 기업은 증설에 나섰다. 이러한 증설은 올해 하반기 공급에 영향을 미쳐 IT반도체 부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증설 혹은 경쟁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은 외부 위협에 흔들리기보다 기업들의 로드맵을 지켜봐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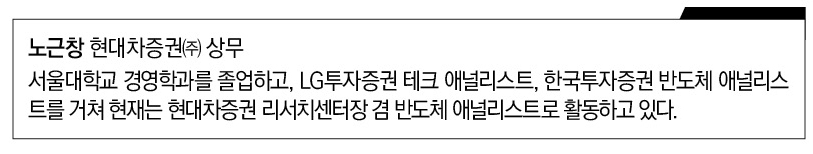
※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