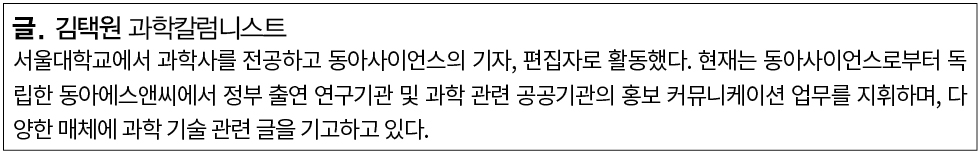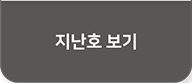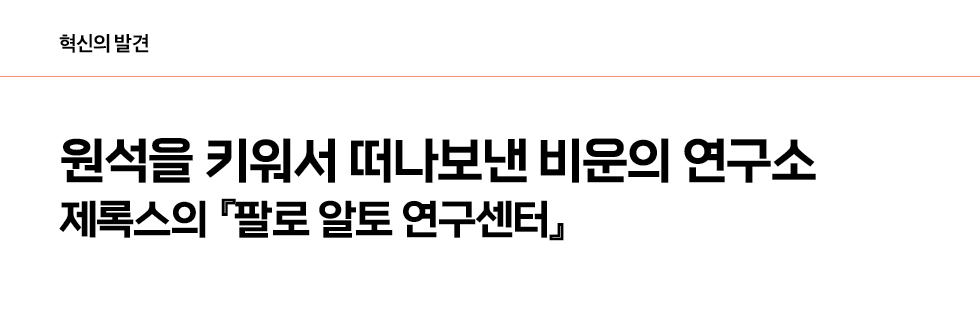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CEO, 데스크톱 시장을 개척하고 스마트폰 시장을 열어젖힌 사업가, 프레젠테이션과 마케팅 전략의 귀재, 디지털 시대의 아이콘.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이 수식어들은 모두 단 한 사람, 스티브 잡스를 일컫는 말이다.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혁신가 중 하나로 통한다. 그러나 이름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잡스에 대해서도 평가가 종종 엇갈리곤 한다. 가장 큰 논란은 잡스와 애플의 성공은 마케팅과 사업화 덕분일 뿐, 기술 자체는 여기저기서 따왔기에 IT 분야의 혁신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곳 중 하나가 ‘팔로 알토 연구소(PARC)’, 일명 ‘제록스 파크’다.

제록스가 설립한 연구소 『팔로 알토 연구센터(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 복사기로 잘 알려진 그 기업, 제록스가 맞다. 2018년 후지필름에 불과 61억 달러에 매각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무기기 기업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사실 제록스는 20세기 내내 기술의 최전선을 내달린 기업이다. 1906년 뉴욕에서 ‘할로이드 사진 회사’라는 이름으로 창업하던 당시만 해도 제록스는 인화지와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에 불과했다.
제록스의 운명을 바꾼 계기는 물리학자 체스터 칼슨과의 인연이었다. 칼슨은 1938년 토너로 사진을 인화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값비싼 인화지나 번거로운 현상액 처리 없이 사진을 바로 종이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아버지로부터 할로이드 사진 회사를 물려받은 조셉 윌슨은 이 기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연구를 꾸준히 후원했다. 상용화할 수만 있다면 칼슨의 기술은 윌슨과 아버지가 몸담아 온 사진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원숙한 단계에 들어서자 윌슨은 칼슨과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사업에 나섰다. ‘암실 없는 사진’을 실현하는 사업이었다.

윌슨은 ‘마른 글씨’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와서 제록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196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칼슨의 발명품은 암실을 없애지는 못했다. 사진은 여전히 복사기가 따라잡을 수 없는 해상도와 색상이라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었다. 그러나 제록스가 출시한 복사기, ‘제록스 914’는 사무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원숭이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복사할 수 있는’ 제품 ‘914’는 사무용 복사기라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복사기 시장을 연 제록스는 세계 최초의 데스크탑 복사기인 ‘813’을 출시하여 ‘책상에 놓을 수 있는 복사기’라는 칼슨의 비전을 실현했다.
실리콘밸리와 ICT의 황금기를 연 PARC
기술로부터 혁신을 이끌어 낸 경험은 제록스의 DNA로 자리 잡았다. 1960년대 내내 제록스는 승승장구했다. 두 대의 914 모델을 전화망과 연결해서 팩스의 개념을 실현하는가 하면, 복사기와 팩스의 인접 분야인 광학과 전산 분야에도 진출하며 사세를 넓혔다. 2대 사장인 피터 맥컬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70년,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를 설립했다. PARC에는 제록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경험 때문인지, 제록스는 PARC의 연구자에게 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했다. 제록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연구자에게 꿈의 직장으로 통했던 한창 때의 구글조차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흥미에 따라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3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PARC의 업무 여건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자연히 PARC에는 쟁쟁한 연구자들이 모여들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을 세운 앨런 케이, 이더넷을 만든 밥 멧칼프, 어도비의 창업자인 존 워녹,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개발을 주도한 찰스 시모니,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 구축을 지휘한 밥 테일러 등이 모두 한때 PARC에 몸담았다. 컴퓨터공학계의 드림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내로라하는 천재들이 모여든 PARC에서는 1970~80년대 내내 중요한 신기술이 쏟아졌다. 마우스 입력과 그래픽 인터페이스, 근거리 통신망의 기반 기술인 이더넷,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위지위그(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고도로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실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이 모두 PARC에서 탄생했다. 심지어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처럼 21세기에나 제대로 구현된 신기술도 1980년대의 PARC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당대 PARC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대중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 최대의 대중문화지 «롤링스톤»에는 1972년 ‘스페이스워’라는 기사가 실렸다. SF 작가이자 기자인 스튜어트 브랜드가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인 팔로 알토에 자리 잡은 두 연구소, 스탠퍼드의 인공지능 연구소와 PARC를 방문하고 쓴 기사다.

두 연구소를 방문한 경험은 기술에 대한 브랜드의 관점을 바꿔놓았다. 1960년대까지 대중문화에서 기술은 종종 통제나 기술독재, 전쟁과 같은 어두운 이미지와 연관되곤 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제각각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내놓고 신기술을 활용해서 게임과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컴퓨터를 이용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PARC는 실리콘밸리의 기술적 구심점이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쟁쟁한 IT 기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제록스와 PARC에 빚이 있다. 특히 애플은 제록스가 다진 토양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는 PARC의 수많은 첨단 기술에 주목하고 1979년, 제록스의 벤처캐피탈 부서와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 대가는 PARC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였다. 잡스가 특히 주목한 것은 ‘WIMP’라고 부르는 GUI의 기본 요소, 창, 아이콘, 메뉴, 포인팅 장치 시스템이었다. 잡스는 이를 애플II의 차기 프로젝트인 ‘리사’에 도입시켜 애플사 컴퓨터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제록스의 치명적인 실수
안타깝게도 PARC의 성과가 곧 제록스의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제록스는 애플이 ‘리사’를 개발하기에 앞서 최초의 GUI 인터페이스를 갖춘 컴퓨터 ‘알토’를 개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않았다. 정부에 제한적으로 납품한 알토를 이더넷으로 연결해서 전화선과는 완전히 독립된 통신망을 구축하고도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이더넷으로 연결한 통신망에 혁신적인 패킷 기반 통신기술을 적용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PARC가 뿌린 씨앗의 결실은 대부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3COM, 어도비 시스템즈와 같은 다른 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남들보다 한두 세대는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제록스의 결정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제록스가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어서 복사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술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해석에 불과하다. UC캘리포니아 버클리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제록스의 임직원들은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록스의 R&D 지원 체계는 당대 최고였으며 PARC도 기술 자체뿐 아니라 상용화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정도로 사업 감각은 있었다. 그렇다고 회사가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