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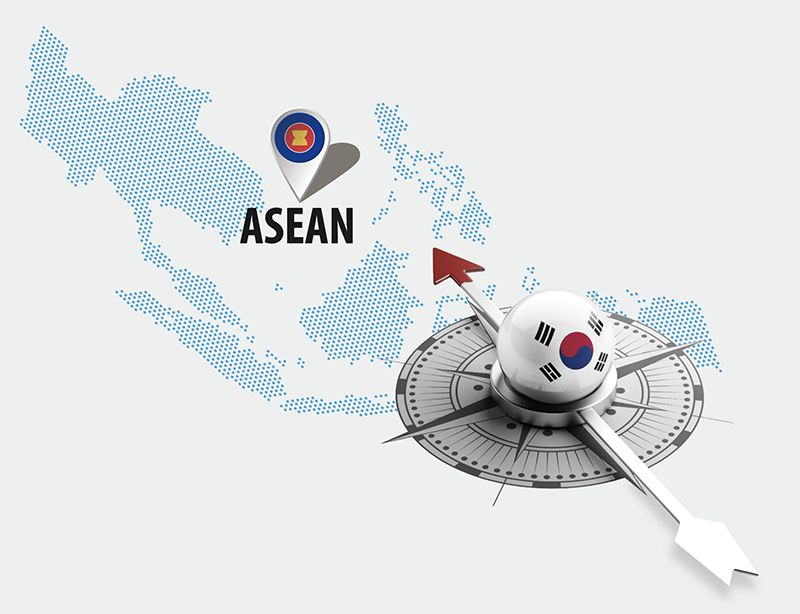
아세안에 대해 강대국은 전략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이후 아세안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세안과 제휴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아세안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아세안은 일대일로(BRI) 전략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사람, 공동번영, 평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적 잠재력 높아
경제공동체로서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 경상 GDP 6위, 상품 수출 4위 그리고 상품 수입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구조에서도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미래에도 계속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개도권 지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아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아세안의 주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아세안 역내 기업에 의한 산업도 성장했다. 화교기업들은 풍부한 농업자원을 기반으로 음식료품, 농가공 등 내수 소비재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팜오일 기반 가공이나, 사료, 육가공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중국으로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서도 아세안은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불균형적인 대아세안 경제협력
한편 우리는 아세안을 주요한 공산품 수출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팜 오일, 주석 등 1차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발해졌고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 되어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결정할 정도가 되었다. 경제협력의 중심은 교역인데, 실제로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은 크게 세 개의 불균형을 갖고 있다. 첫째, 경제협력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둘째, 경제협력 구조가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CLM)와의 협력 수준은 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아세안과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
아세안은 미래에도 우리의 주요한 협력지역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세안을 현재의 진출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상생의 협력자로 봐야 한다. 현재의 경제협력 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아세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아세안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충하고,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도 확대해야 한다. 경제협력의 방향도 공산품의 무역과 투자에서 서비스, 디지털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협력을 보다 다각화, 고도화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글/ 박번순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오랫동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연구했으며, 태국의 탐마삿 대학과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원(ISEAS)에서 동남아 경제를 탐구하기도 했다.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