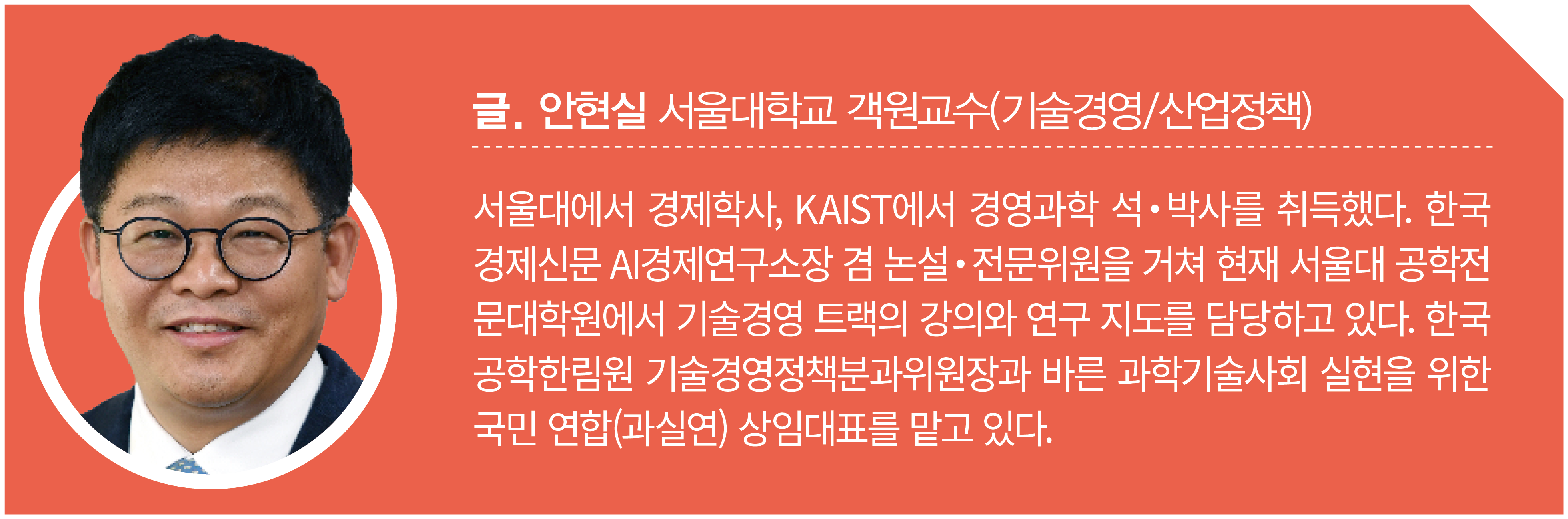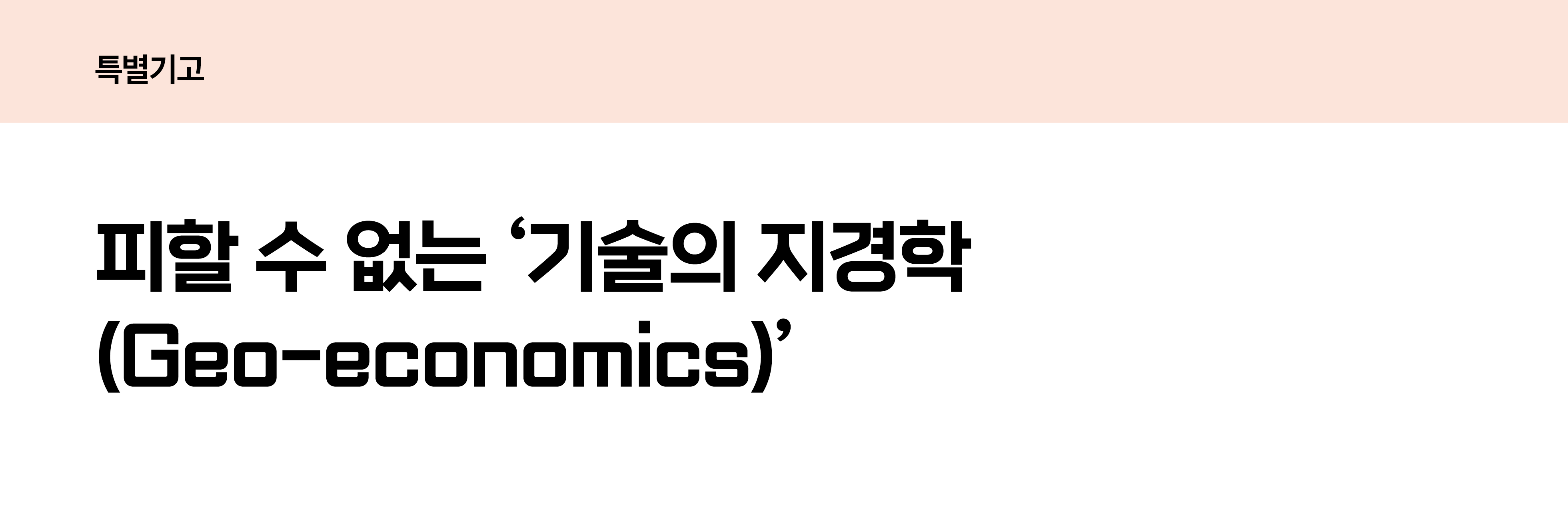
경제 안보를 위한 ‘Power Economics’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일본 아사히 신문 주필은 지금의 시대를 고찰하면서 ’지정학(地政學)‘ 개념을 다시 소환했다. 지정학이란 땅의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를 무기로 상대국을 지배하는 등, 군사력을 이용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군사만이 무기가 아니다. 후나바시 주필이 말하는 ‘지경학(Geo-economics)’에서는 땅의 지도를 펼쳐놓고 경제를 무기로 상대국을 지배하는 등, 경제력을 이용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군사에서 경제로, 싸움의 도구(무기)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사는 물론 경제, 경제 중에서도 기술이 무기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도 경제 안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로서의 한국과 한국 기업은 이 유례없는 엄혹한 경제 안보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미‧중 충돌 100년 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도 자본주의는 엄청난 쇼크로 허우적거렸다. 반면 중국이라는 버팀목은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대조적인 장면은 그 후 치열한 미‧중 충돌의 예고탄과 다름없었다. 두 나라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한 가지 단서는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살펴보면, 미‧소 대결은 지난 세기 전체에 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중 충돌 역시 21세기 전체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
돌아온 산업정책=f(기술‧경제‧안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산업정책의 화려한 귀환이다. 현재 산업정책의 주류는 ‘임무(미션) 지향 혁신정책론(1, 2, 3세대)’, ‘혁신기반 경제안보론(미국)’, ‘기술주권론(EU)’ 등이 혼합되며, 기술+경제+안보의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국(또는 경쟁국 기업)이 먼저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용화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경제 안보 위협이 된다. 그렇기에 ‘혁신의 정치학’이 주목받고 있다. ‘외부 위협’과 구질서와 신질서 간 ‘내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혁신율’과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정치의 핵심 어젠다가 되고 있다. 바야흐로 연구‧개발 투자가 ‘속도의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로서 한국의 선택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적 모호성’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택하는 ‘전략적 명료성’은 우리의 독자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더 위험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의 ‘기술 존(tech zone)’이 될 수 있다. 미국도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억지력’을 확보하면 한국의 독자적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전략적 모호성’도 ‘전략적 명료성’도 아닌, ‘전략적 존재성’이다.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적 불가결성’이 ‘전략적 존재성’을 가진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 답이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앞으로 100년 넘게 지속될지 모를 기나긴 기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