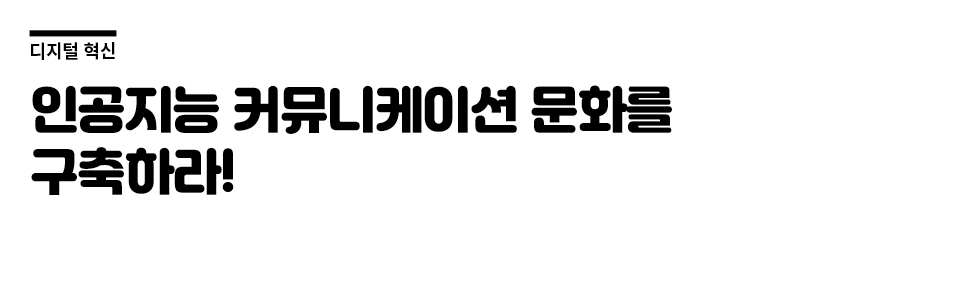

1990년 스탠퍼드대 심리학과에서 ‘두드리는 자와 듣는 자’라는 간단한 실험을 고안했다. 120쌍에게 같은 실험을 되풀이했다. 안타깝게도 세 명밖에 맞추지 못했다. 2.5%의 정답률로 매우 낮았다.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실험 전에 두드리는 사람에게 예행연습을 시킨 후, 듣는 사람이 이 노래를 얼마나 맞출 것인지 예상해 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50% 정도가 상대방이 노래를 맞출 거라고 예상했다. 2.5%와 50%, 너무 차이가 크다. 이 실험은 정보나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줬다. 그래서 이 현상을 ‘지식의 저주’라고 한다. 지식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상황과 사정, 즉 컨텍스트를 공유해야 한다.
잘 되는 조직은 같은 언어를 쓴다
뛰어난 경영자는 조직 내 공유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애플은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데, 이는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의도적으로 일궈낸 것이다. 잘 되는 기업은 조직이 커져도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독특한 문화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의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도입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자나 데이터 과학자만 활용하던 단계를 지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자주 사용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인공지능 기술에서 자주 쓰는 용어나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더 심각한 경우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전략 방향과 다르게 실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시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경영자나 의사결정자는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한다. 그래야 조직의 전략과 방향에 맞게 인공지능 기술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모델의 분석 결과가 절대적으로 옳은 경우는 없다. 전략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다르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 조직의 필수과목이 됐다. 인공지능을 멀리했던 사람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 전문가가 커뮤니케이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 문외한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래야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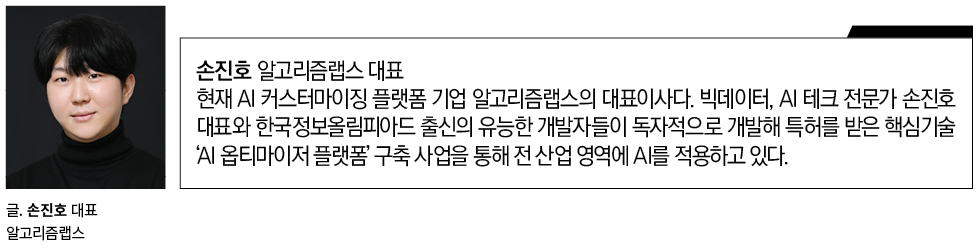
※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