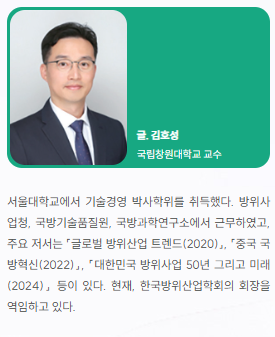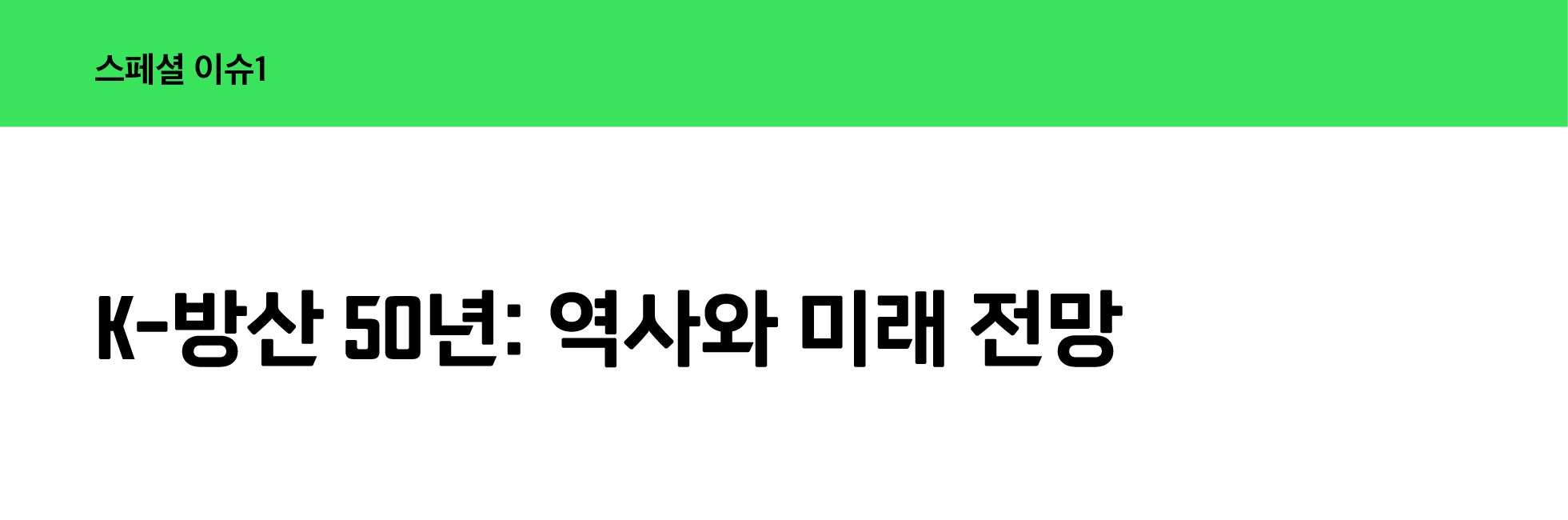
1. 안보위기 속에서 태동한 한국 방위산업 (1970년대)
1970년대 한국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절박한 요구 속에 출발하였다. 닉슨 독트린 발표와 주한미군 감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방위산업 자립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였다. 1971년 ‘번개사업’을 통해 M16 소총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를 시도했고, 1974년부터는 ‘율곡사업’을 통해 자주포, 전차 등 중장비 개발도 착수하였다. 외산 무기의 역설계를 통한 개발, 중화학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방산 기반을 정착시키며, 국산 무기 생산이 본격화되었다.
2. 위기와 도전 속 한국 방위산업의 지난한 여정 (1980~2000년대 초)
1980년대는 방산 구조조정과 ADD 기능 축소, 외산 무기 선호와 방산 비리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K1 전차, K200 장갑차, 천마 방공무기 등이 개발되며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다. 제도적 비효율과 기술 자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개혁 2020’이 추진되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정보화전과 정밀유도무기 개발이 강조되며 T-50, KT-1, 현무 미사일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2006년 방위사업청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3. 방위사업청 출범, 한국 방산의 전환점
2006년 방위사업청은 무기획득의 비효율과 방산비리를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위사업 수행을 위해 출범했다. 방위사업 절차의 투명성, 방산 기반 육성, 수출 확대 등이 핵심 목표였으며, 이후 한국은 K9 자주포, FA-50, K-2 전차,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방산은 전략적 외교 수단으로도 자리 잡았다. AI, 빅데이터,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도 본격화되었다.
4. 글로벌 K-방산, 도전과 과제
2020년대 K-방산은 하나의 브랜드로 부상했으며, 폴란드와의 17조 원 규모 계약을 통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과제도 뚜렷하다. 첫째, 수출 품목이 재래식 무기에 집중되어 있고, 첨단 방산 스타트업 부문은 아직 미약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역량 부족과 생태계의 불균형, 셋째로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 넷째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주요한 도전 요소다. 앞으로 K-방산은 기술력과 외교, 정책이 융합된 전략 산업으로서 ‘글로벌 방산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