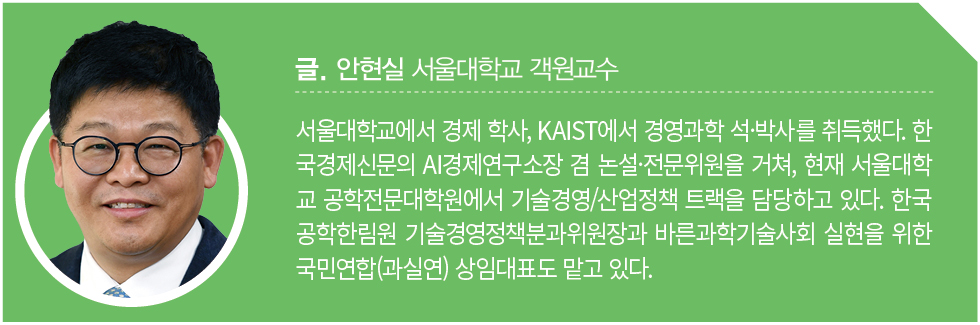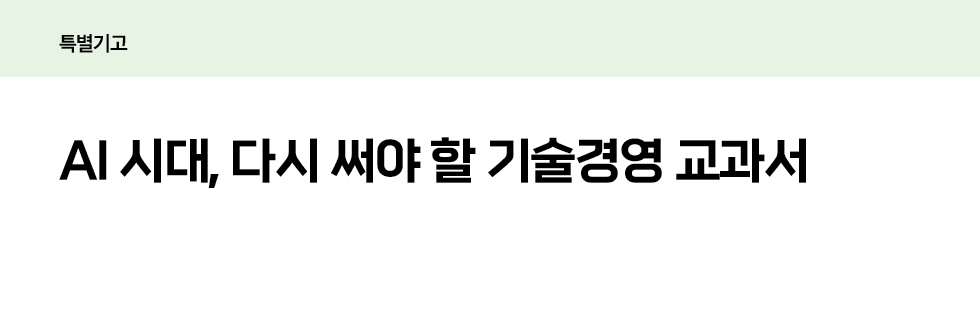
무엇이 대(大)전환인가
대전환이 소전환과 다른 것은, 한마디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소전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전환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답은 명확하다. 지금은 ‘비상식’이지만 미래의 ‘상식’을 향한 시도가 많이 일어날수록 유리한, 곧 ‘다양성(diversity)’이 생존의 키(key)라는 얘기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AI 게임 체인지
기존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 AI 시대다. 왜냐하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체인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AI 게임 체인지의 임팩트(impact)는 역사상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AI가 바꾸는 기술경영 교과서
AI를 상징하는 GP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래의 기술경영 이론을 뒤흔들고 있다. 아니, 기술경영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판이다.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가설적 추론을 제기해 본다.
1) ‘생산성의 역설’이냐, 측정의 한계냐
AI 등 디지털 투자를 하는데도 기대하는 생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은 규제 등 구조적 장벽(hurdle) 탓도 있지만, 측정의 한계도 있다. 이런 주장은 AI 시대에 맞는 생산성, 성장 지표를 개발하면 기업 경영, 국가 경제의 성과 비교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진다.
2) 기술혁신이냐, 기술확산이냐
발명 및 발견의 상업화로 정의되는 기술혁신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지는 기술확산은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게임 체인지는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확산으로 완성된다. 미·중 충돌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3) ‘R&D’에서 ‘Fast R&D’로
R&D 앞에 Fast(빠른)가 붙은 ‘Fast R&D’가 AI로 가능해지면서 경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누가 시간 변수에서 앞서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공산이 크다.
4) 혁신 주체의 다변화·민주화
산·학·연이라는 도식화된 혁신 주체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챗GPT의 오픈AI는 기업 펀드를 받는 민간비영리재단(private non-profit) 소속이다. AI 시대 떠오르는 혁신 주체로 개인과 민간비영리재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혁신 형태와 패턴의 교체
어쩌면 앞으로는 제품혁신, 공정혁신이 아니라 데이터 혁신, 알고리즘 혁신, 대화형 혁신, 생성형 혁신이 지배할 것이다. 플랫폼 혁신도 AI 에이전트(AI agent) 혁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AI로 무장한 ‘사용자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다.
선택지는 무엇인가?: ‘도주론(逃走論)의 기술경영’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사라진다. 일본의 아사다 아키라의 ‘도주론’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도망가야 한다. 여기서 도망의 진짜 의미는 변화를 위한 대(大)이동이다. 다른 말로 하면 AI로 무장하는 대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