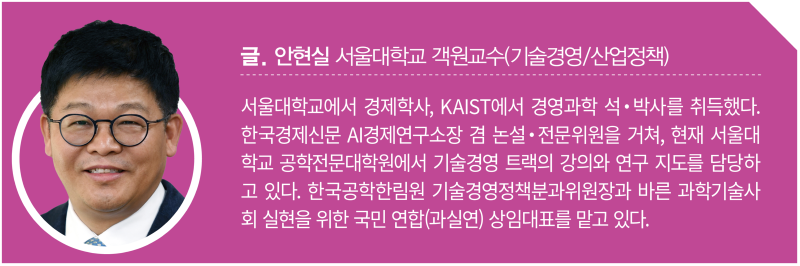특별기고
AI와 탄소중립, ‘쌍 혁신(Dual Innovation)’을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는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등 여러 경기 사이클이 있다. 그중 초장기 경기 사이클은 콘드라티예프 사이클(Kondratiev Cycle)로 불린다. 증기기관, 철도, 전기 등 거대한 기술혁명이 몰고 오는 사이클이다. 지금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發) 초장기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전망이 많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초장기 사이클이 거대한 기술혁명과 함께 에너지 혁명도 동반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초장기 사이클에 적용하면, AI 혁명은 에너지 혁명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에너지 혁명 없이 AI 혁명이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이 두 가지 혁명을 동시에 완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목되는 중국의 신(新) 발전 전략
중국은 신(新) 발전 전략으로 ‘쌍순환(Dual Circulation)’과 ‘쌍 전환(Dual Transformation)’을 내세우고 있다. 해외시장을 의미하는 외수 확보와 중국 안의 내수 확대가 쌍순환이라면, 디지털 차이나와 그린 차이나로의 전환은 쌍 전환이다.
쌍 전환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그리고 이를 각각 상징하는 AI와 탄소중립이 상호 선순환하는 ‘쌍 혁신(Dual Innovation)’이 가능할 것인가. ‘에너지 혁명 없이 기술혁명 없고, 기술혁명 없이 에너지 혁명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비단 중국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과제일 것이다.
AI와 탄소중립, 어떠한 관계인가
AI는 전력 수요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AI가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촉발하면서 탄소중립에 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는 다시 AI 혁신과 확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AI 혁명으로 산업이나 생활의 각 부문에 걸쳐 생산성 증대 효과가 본격화되면, AI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AI가 에너지 수요와 탄소배출에 ‘중립적(neutral)’이도록 하는 또 다른 목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AI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IEA가 제시한 탄소중립 달성의 4가지 조건과 AI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2050년 넷제로 공정표’를 통해 주요국이 2050년 전후로 제시한 넷제로 달성 목표연도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①각 산업에서의 전례 없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전기화(electrification)의 확산 및 전력망의 혁신, ③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술 및 자금 협력, 그리고 ④소비자의 담대한 행동 전환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벅찬 과제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진 또 다른 과제
AI와 탄소중립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급부상했다.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문제와 단기적 에너지 안보 문제가 동시에 등장한 형국이다.
더 많은 에너지(more energy), 더 적은 탄소(less carbon)’라는 상호모순된 다목적 함수 풀기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각국의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와 탄소중립의 관계로 좁혀 말하자면, AI의 활용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문제와 이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전쟁 무기로서의 에너지 지정학’, ‘경제 안보로서의 에너지 지경학’을 모두 고려하면, 에너지 및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특히 절박한 과제다.
에너지·환경정책의 시그널부터 바로잡자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AI의 혁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친환경 탈탄소라는 그린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탄소중립을 통해 RE100 또는 무탄소 AI로 나아가고, 동시에 AI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쌍순환 혁신(Dual Innovation)’은 국가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원전의 전략적 활용 등을 바탕으로 AI와 탄소중립 간 선순환 혁신을 위해 질주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