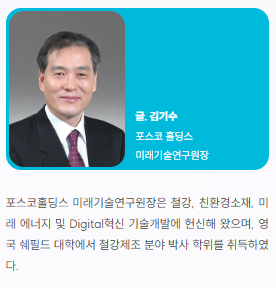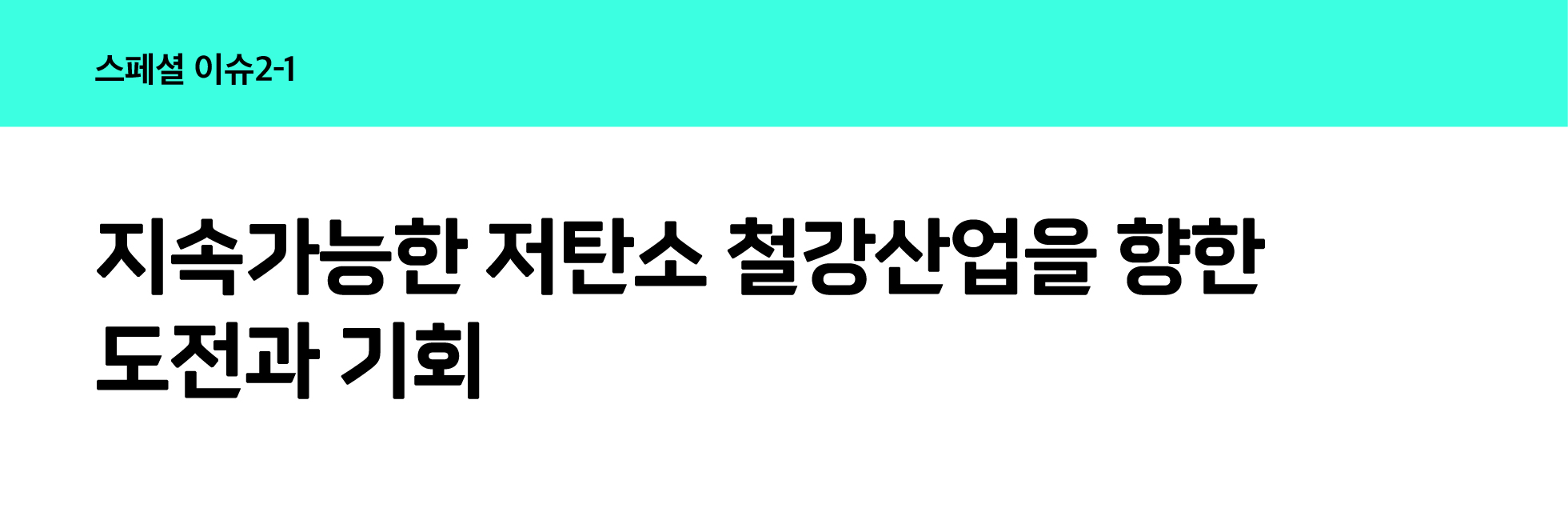
국내 철강산업의 현재
국내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원으로, 세계 6위 조강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약 15만 명의 직접 고용과 50만 명 넘는 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인당 철강 소비량은 약 1,050kg으로 글로벌 평균의 5배 수준이며,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반영한다. 그러나 고로(Blast Furnace) 기반 생산이 주류를 이루어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배출이 높아, 탄소중립 시대에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철강산업과 에너지
2023년 국내 조강 생산량 6,670만 톤 중 70%는 고로, 30%는 전기로에서 생산되었으며, 철강업 전력 사용량은 국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기로 비중이 70%에 달하며, 주요 기업들이 전기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전기로 비중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같은 혁신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만, 수소환원제철은 고로(Blast Furnace) 대비 약 20배의 전력과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가 필요하다.
탄소감축 기술개발 현황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확대,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무탄소 제철공정이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CO₂ 대신 수증기를 배출하며, 포스코의 HyREX 공정은 유동환원로를 활용해 경제적이다. 그러나 상용화에는 막대한 전력과 수소가 필요하며, 고로 대비 약 20배의 전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대용량 청정수소와 전력 공급 인프라가 필요하다. 청록수소는 열분해로 CO₂ 대신 고체탄소가 생성되어 블루수소와 함께 단∙중기적 솔루션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철소 인근에 구축된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한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원전·수소)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역 상생 방안은 선결 요건이다. 향후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