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Intro
속도 붙은 중국의 로봇 굴기, 한국 산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의 로봇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산업발전규획 등 다수의 정책을 통해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과 보조금 성격의 비용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로봇 기업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덕분에 중국 제조업용 로봇의 자국산 점유율은 2015년 17.5%에서 2023년 47%로 급성장했다.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연계를 통하여 로봇의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기술 개발 주기도 빠르게 단축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로봇 생태계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부가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클러스터 내 R&D와 실증, 국산화, 금융을 지원하고 조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창업 인프라를 통해 로봇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AI 생태계와 연계하여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은 중국 로봇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보스턴의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피츠버그의 로보틱스 네트워크(Pittsburgh Robotics Network),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Silicon Valley Robotics)와 같은 클러스터를 통해 로봇 기업의 스케일업과 인재 양성 및 생태계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로봇 생태계의 강점은 AI 및 로봇 분야의 세계 정상급 대학을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여, 이것이 기업 투자나 인수 합병 등 로봇 창업 및 투자로 선순환되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오랜 전통을 가진 로봇 강국으로, 제조업용 로봇 및 부품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로봇 정책 및 로드맵의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로봇산업은 로봇 부품부터 완제품까지를 제조하는 기업, SI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투자기관, 표준화 인증기관, 협회 등 로봇 생태계의 주체 요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로봇 제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왔고,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실증 경험도 풍부하다. 또한 로봇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의 제조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도 있다. 하지만 국내 로봇 시장은 그 규모가 작고 기업 간 협력체계가 약하며, 중국에 비해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로봇 산업에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가 많아 투자 자본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인재 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로봇 굴기는 한국 로봇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 로봇 산업은 중국 로봇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으며, 한국의 로봇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 로봇 산업이 기술력과 품질을 차별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로봇산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같은 위기 상황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기존 시장에서 니치(niche) 마켓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aptive Market이 작동하여 국내 로봇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 한국 로봇산업은 중국의 성장이 주는 압박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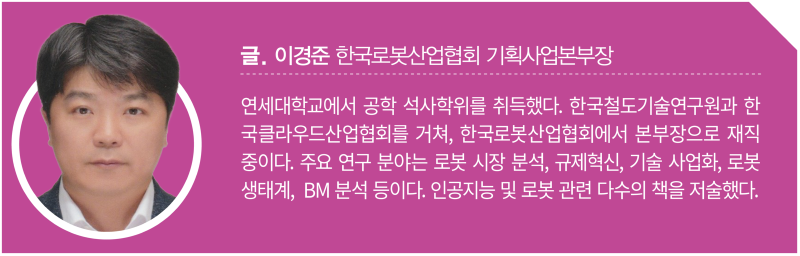
'전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