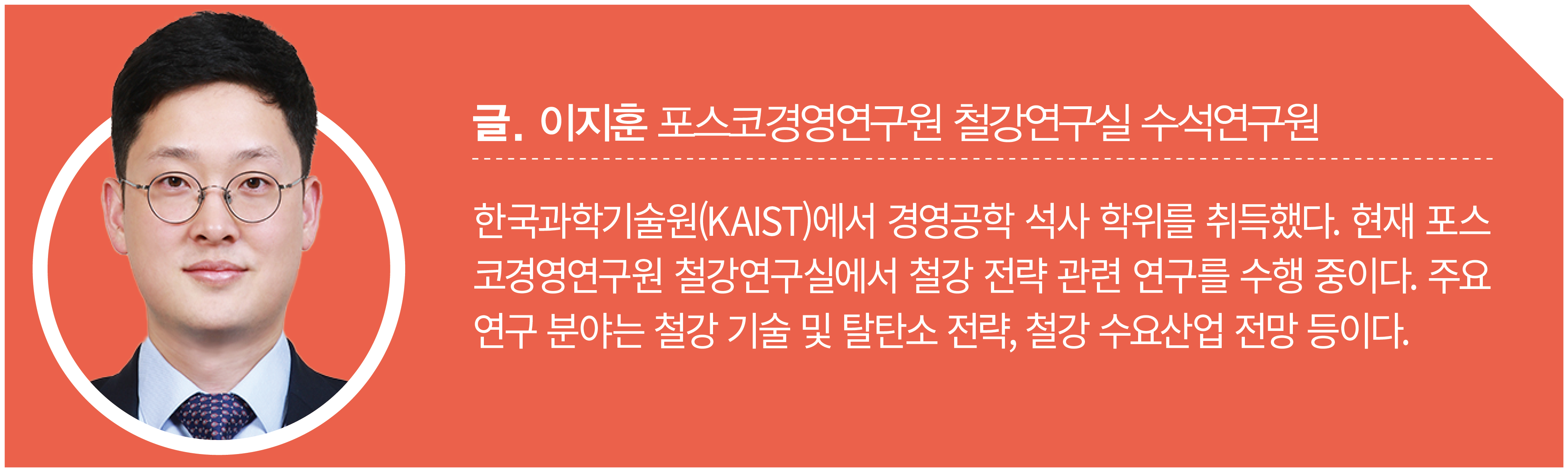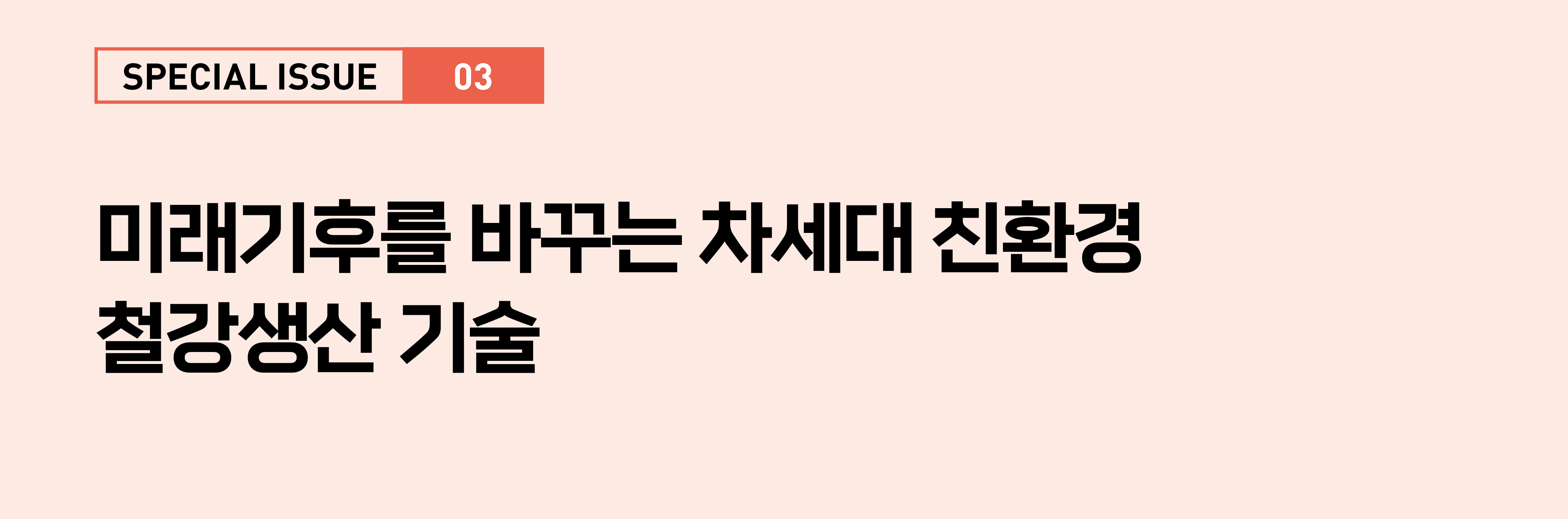
현시점의 상용 탈탄소 철강 공정 기술의 한계점과 리스크
철강 산업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철강사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앞다투어 발표하였다. 그 중 특히 유럽 지역의 철강사들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탈탄소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설비의 가동과 실제 그린스틸의 상업 생산은 별개다. 그린수소나 재생 전력, 고품위(Fe>67%) 철광석 등 그린스틸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제한적인 원료의 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그린스틸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CCU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강 공정에의 적용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운송하고 저장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CCUS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은 불가능할 것이다.
상용 기술의 한계 극복에 도전하는 차세대 Breakthrough 철강 공정 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진 기존 철강 생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차세대 기술들도 곳곳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에서는 각종 인프라나 공급이 부족한 원료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산화탄소 운반과 저장 관련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미생물 활용 CCU 기술, 수소와 고품위 철광석이 요구되는 샤프트로 기반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분해 기술 등이 그것이다.
Lanzatech, 미생물 활용을 통해 철강 공정 부생가스 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
Lanzatech라는 기업은 미생물에 활용하여, 철강 공정의 부생가스 내 탄소를 에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해당 공정에서 생성된 에탄올은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를 비롯해 다양한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포집된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는 EOR(Enhanced Oil Recovery)에 사용되는 상황과 대조된다. 그뿐만 아니라, 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에탄올은 액화를 위해 가압과 냉각이 필요한 이산화탄소 대비 운송과 저장 과정에 있어 뛰어난 경제성을 지닌다.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보스턴 메탈의 용융 산화물 전기분해(MOE: Molten Oxide Electrolysis)
보스턴 메탈이라는 기업은 수소 없이, 그리고 철광석 내 철 함량이 낮은 저품위 원료로도 그린스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의 상용 수소환원제철 기술 대비, 원료 수급의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용융 산화물 전기분해(Molten Oxide Electrolysis, MOE) 기술이다.
Electra, 미국 철강 공급망에 최적화된 전기분해 공법 개발
마지막으로 Electra라는 기업은 약 60℃의 저온에서 작동하는 전기분해 공정을 통해,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석출해 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저온에서 작동되므로 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전력량이 적다. 따라서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도 안정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며, 철 함량이 낮은 저품위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필요성
앞서 언급한 Lanzatech, 보스턴 메탈, Electra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기업이 주요 철강사, 철강 원료 공급사들로부터 오랜 기간 투자와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이나 기술이 검증되거나 대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러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과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일으킨 혁신 기술들이 그랬듯, 현재 초기 단계의 철강생산 기술들 중 어떤 것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혁신 기술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유망한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정책적 지원으로 그들의 혁신 기술 개발 시도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