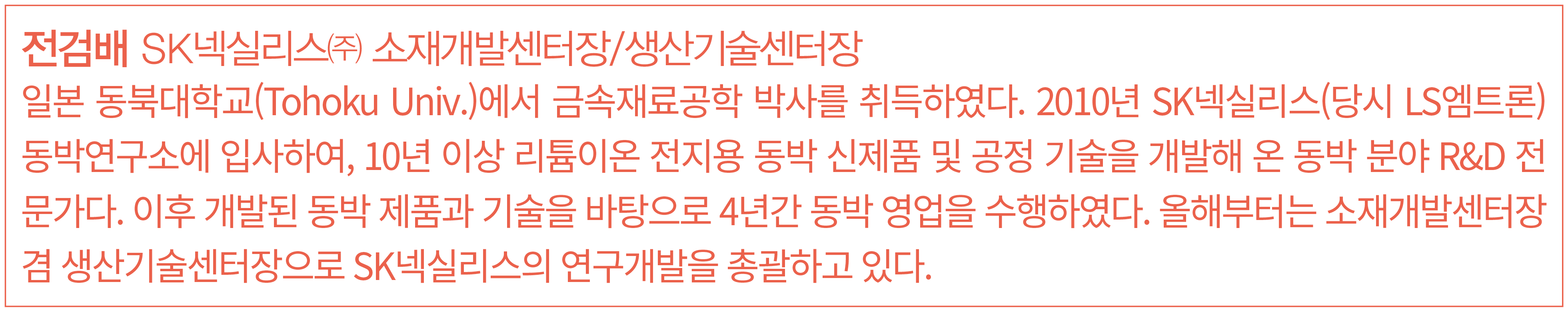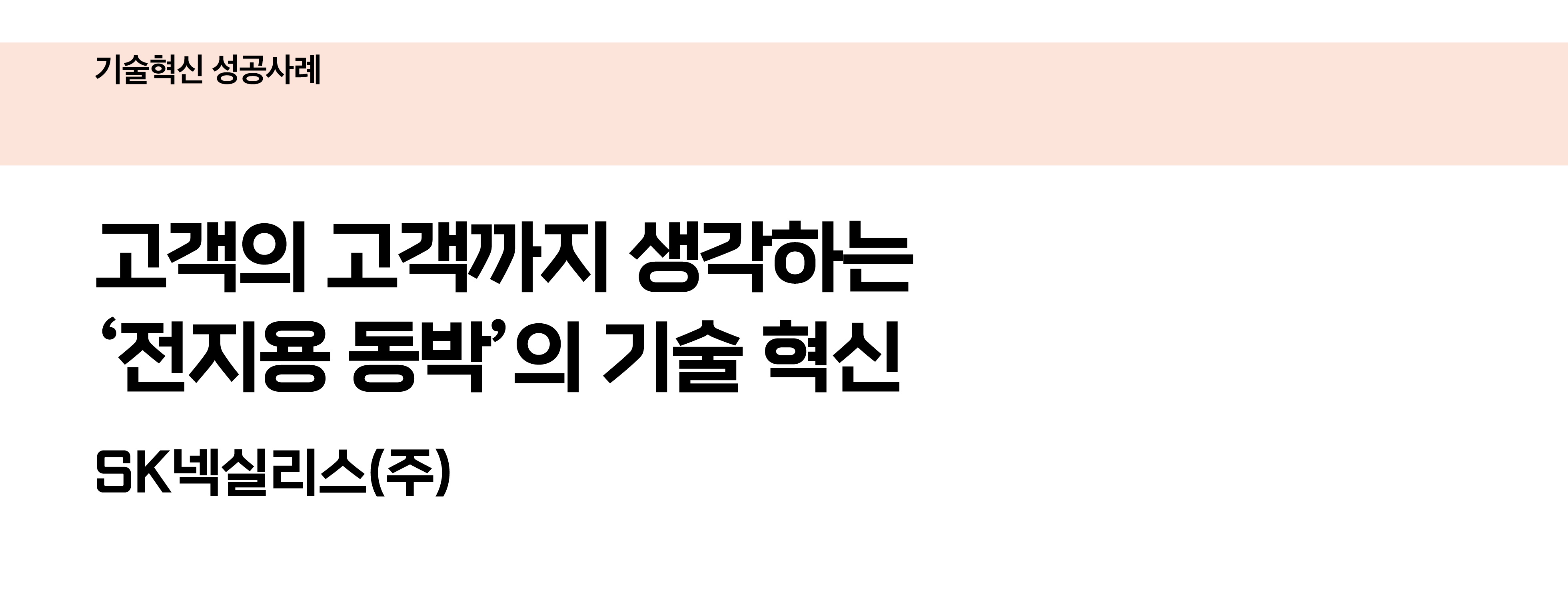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는 ‘동박’이라는 아주 얇은 구리 호일과 음극 활물질로 구성된다. 이차전지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 동박은 마치 표준화된 기성품 하나만 존재하는 듯 느껴졌다. 하지만 고객의 새로운 니즈로 인해 동박의 혁신이 시작되었다.
2019년 14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SK넥실리스의 동박은, 오늘 출근하여 내일 퇴근하는 몰입의 시간을 통해 기술혁신에 성공했다. SK넥실리스는 2024년 현재에도 ‘고객의 고객까지 생각하는 기술혁신’의 자가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박이란 기본적으로 구리를 얇게 펴서 박막으로 만든 것이다.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동박은 4~10㎛의 매우 얇은 high-end 동박으로, 전해도금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폭 1,400mm 두께 4㎛의 얇디얇은 구리 막을 찢김 없이, 구겨짐 없이 수십 km 길이로 감아 roll을 만들어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박 제품이 된다. 여기에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과정의 혹독한 공정을 견디기 위해 ‘고강도’여야 하고, 높은 열에 견디면서 동시에 잘 늘어나는 ‘고내열(高耐熱), 고연신(高延伸)’의 물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차전지의 사용 과정에서 충‧방전을 반복하면 열이 발생하고, 음극재 활물질의 기본 성질상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면모 때문에 동박은 이를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물성이 요구된다. 왜 동박 제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K넥실리스는 이러한 동박을 다음의 두 가지 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구현해 냈다.
첫 번째 기술 자산은 ‘물성 데이터베이스’다. 물성 데이터베이스는 고객사의 다양한 물성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물망처럼 작용한다. 그물망이 촘촘하고 튼튼할수록 고객의 요구사항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지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고객을 만족시킨다.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기 위해 SK넥실리스 연구원들은 수많은 레시피를 실험했고,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가 없다면 합성하여 새로운 첨가제를 만드는 노력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술 자산은 ‘생산성 검증’이다. 이는 첫 번째 기술 자산인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과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 과정이다. 물성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 △레시피 조성 △레시피 재료의 합성 방법 △동박의 물성 결과라면, 두 번째 기술 자산의 핵심은 △물성을 유지한 채 양산이 가능한지를 검증한 결과다.
현재 SK넥실리스의 소재개발센터와 생산기술센터를 겸임하여 이끄는 전검배 센터장은 “양산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개발은 작품 활동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동박 실험실 샘플을 A4용지 크기로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를 고객이 원하는 물성으로 수십 km 길이의 편차 없는 roll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양산이 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SK넥실리스는 R&D 방향을 과거의‘Thinnest, Widest, Longest’에서 ‘고객의 고객까지 생각하는 R&D’로 재설정했다. 이차전지 제조사를 넘어 전기자동차 제조사까지, 고객의 고객까지를 앞서 생각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새로운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 자산은 역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넥실리스가 앞으로 또 어떠한 기술 자산을 축적해 나갈지 그 미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