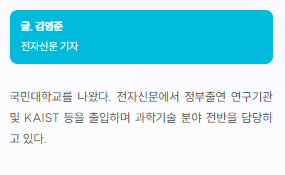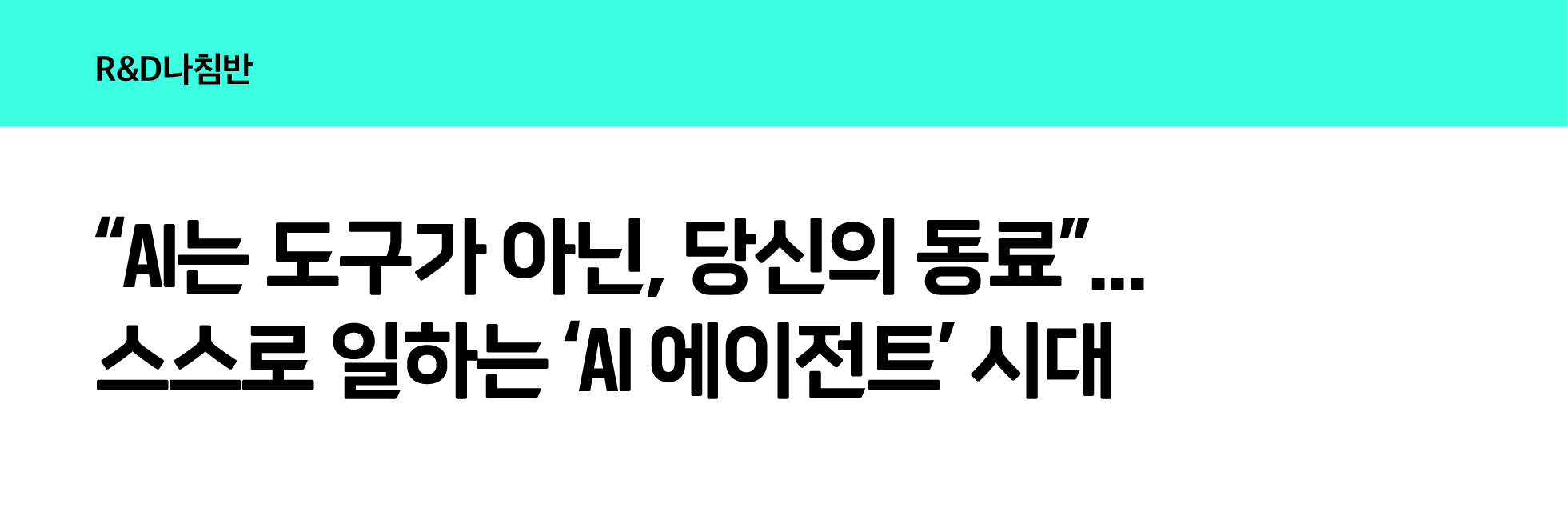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사람과 협업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뤼튼’은 지드래곤 광고로 주목을 받으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사용자의 간단한 지시어만으로 문서 작성, 기사 요약, 이메일 초안 등을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은 사용자의 요청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챗봇이나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동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회의 일정을 요청하면, 참석자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회의 초대를 보낸다. 인간의 개입 없이 이 모든 과정이 실행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경쟁에 뛰어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365 전반에 ‘코파일럿’을 적용했고, 구글은 ‘버텍스 AI 에이전트 빌더’로 누구나 AI 도우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오픈AI는 GPT 모델이 외부 시스템과 연동해 작업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를 선보였다.
국내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SK텔레콤은 AI 비서 ‘에이닷’을 통해 스마트홈·콘텐츠·일정 관리 등을 통합했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쇼핑·검색 분야의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통, 건설, 제조업계도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무 AI 스타트업 솔로몬랩스는 회계 자동화로 주목받고 있다.
예술, 도시, 공공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감정 기반 AI 피아노 ‘이봄’을 개발했으며, 대구시는 ETRI와 함께 AI 기반 디지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발전소, 도시 인프라, 공공행정 전반에 AI가 도입되어 ‘디지털 공무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도적·윤리적 고민도 커지고 있다.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인간을 대신하게 될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문가들은 기술의 효율성만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적 설계와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설계하고 조율해야 할 동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