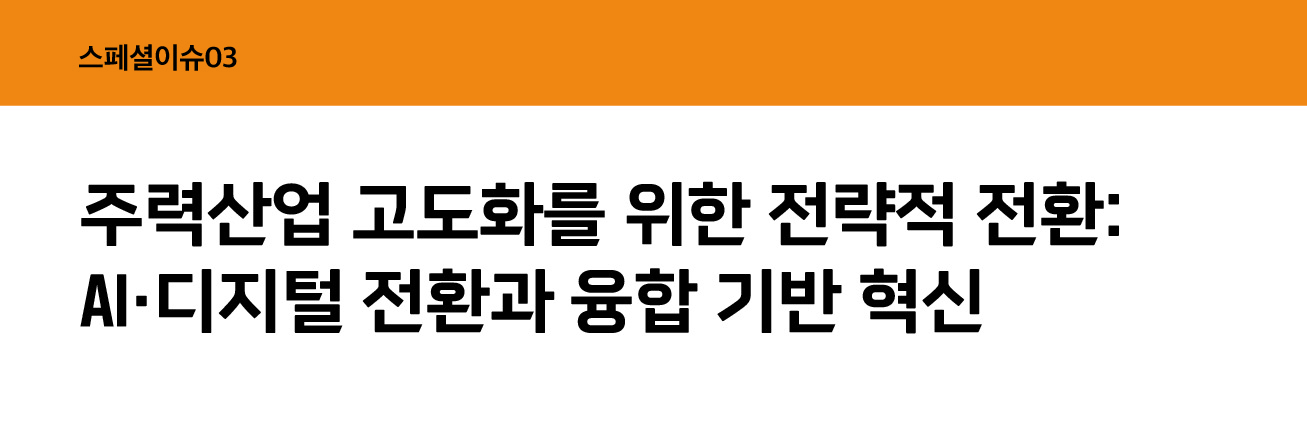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기반의 주력산업을 통해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산업의 성장 동력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재편 속에서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실태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AI 및 디지털화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실제로 AI 기반 공정 최적화, 스마트 품질관리 등 핵심 기술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으로의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접근성 격차도 산업 생태계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 상생형 R&D,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부족이 기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AI 전환과 융합, 인적자원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은 AI Transformation(AX)과 Digital Transformation(DX)의 전면적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졌기에,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구조 혁신은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이 산업 현장의 변화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지금, 직무 기반 재교육(Re-skilling)과 고숙련화(Up-skilling) 프로그램은 국가경쟁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다. 이제는 인재 육성의 컨셉 자체가 교육(education)에서 학습(learning)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우수 인재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서, 자산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지닌 전략적 자원이다. 이들은 언제든 세계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산업정책의 방향: 이원적 접근과 정부 역할 강화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R&D 보조금과 같은 직접 투자보다는 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의 혁신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기술 불확실성과 초기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 진입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는 정부가 초기 기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고위험 R&D 지원,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제휴 인센티브 정책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주력산업은 구조 전환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산업의 성숙도와 기술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한 ‘이원적 전략’을 펼쳐야 한다. 주력산업은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민간의 자율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SRI International, OECD 등에서 일하며 주로 기술혁신 정책, R&D 투자전략, 연구개발평가를 담당했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기술정책 및 성과확산 MD로 봉직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혁신전략, R&D 제도·규제 정책, 개방형 혁신, 기술사업화, 기술 인텔리전스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