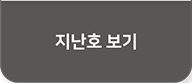생활 속 과학탐구 - 표준시의 탄생
생활 속 과학탐구는 일상생활 속 물리학, 첨단과학, 과학일반에 대해 살펴봅니다.
글_ 이소영 과학칼럼니스트
텔레비전 국제 뉴스 배경에는 바늘이 각기 다른 곳을 가리키는 시계가 단골로 등장한다.
런던, 파리, 모스크바, 서울, 뉴욕 등 세계 각지에서 특파원을 연결한 뉴스 앵커는 으레 현지 시간을 확인하는 걸로 대화를 시작한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뒤 끊겼던 판문점 전화를 재개한 첫날, 통화는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북쪽은 9시에 우리 측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과 북이 사용하는 표준 시간대가 달랐던 탓이다.
마치 서울과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오전 9시에 통화하자”라고 약속만 해두고, 그 9시가 서울 시간인지, 뉴욕 시간인지를 정해두지 않은 꼴이었다.
지난 5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은 다시 표준시를 남한과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는 해프닝이다.
이 사건 덕분에 많은 이들이 ‘표준시’라 불리는 ‘협정 세계시’는 말 그대로 사람이 협의해 정했을 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지구는 둥글고, 수박 표면에 난 검은 세로줄처럼 15도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경계선이 있다.
360도의 구를 15도씩 나눈 24개의 시간 구분선이다.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표준시의 역사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본래 하루 24시간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을 뜻하고 정오는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떠 오른 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시간은 그 사람이 현재 지구 위에서 위치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오랜 세월 각자가 살고 있는 곳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의지해 하루를 살았다.
고대 인류에게 하루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자연의 섭리였으며 그 뒤로도 오랜 시간 인간은 아침이나 저녁, 정오나 자정 같은 대략적인 구분만으로도 별 일 없이 살았다.
기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차가 생기기 전까지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은 말과 마차였다.
아무리 서둘러 움직여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틀은 걸렸다. 하지만 이제 KTX를 타면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한다. 장거리를 동서로 움직일 때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기차가 처음 생겨 대륙을 횡단할 수 있게 된 19세기에 사람들은 시간이 엉망으로 꼬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시카고와 뉴욕은 1천 3백㎞가량 떨어져 있다.
마차의 시대에는 하루 만에 상대 도시로 이동하기란 불가능했다. 해가 지면 하루 묵고 다시 해가 뜨면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차의 시대에 도시들은 훨씬 가까워졌고, 사람은 이전시대와 비교하자면 ‘순간이동’이라 할 정도로 순식간에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던 도시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1883년 무렵 미국 철도 중 47개 노선은 뉴욕 시간에, 36개 노선은 시카고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는 필라델피아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다. 기차역 앞 광장 시계탑이 낮 1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기차 승강장에서는 12시 기차가 출발 준비를 한다.
사람들은 7시 출발, 기차는 8시에 타야 한다는 식으로 번거로운 셈을 해야 했다.
요즘은 비행기로 외국을 드나드는 일이 빈번해져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니 날짜가 어제로 바뀐다든가 하는 시간 변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기차가 처음 생겼던 시절에는 어땠을까? 우왕좌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은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뉴욕과 시카고는 1시간의 시차가 있다. 고작 1시간 차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시간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베이징과 서울은 1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그 대수롭지 않은 1시간의 차이로 1914년부터 209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설날이 다른 날이 15번 발생한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커졌다.
배와 비행기의 운항, 전보, 전화, 인터넷 등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신, 국제 금융, 지구를 운행하는 위성과 우주여행 등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다.
초창기의 시계에는 초침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시간의 기본 단위로 초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시간, 1년 365일은 지구의 공전시간으로 알고 있다. 24시간에서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러니까 1초는 하루의 8만 6,400분의 1이다. 그렇지만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은 평균치일 뿐이다. 실제로 지구의 자전은 여러 변수에 의해 차이가 난다.
달에 의한 조수간만의 차,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급격한 기후 변화도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공전은 자전보다는 변동이 적지만 그 역시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다. 1년은 대략 365.24219879일이다.
그러니 1천분의 1초, 1만분의 1초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현대문명에서는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졌다.
1950년대 후반 하늘의 해와 달을 대신해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이 새로운 초의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1967년 세계의 초의 기준으로 공인되었다.
새로운 시간, 1초의 기준은 세슘 - 133(133Cs)원자의 운동 속도로 정해졌다. 세슘 원자는 안정적이면서, 진동수를 측정하기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새로운 1초는 세슘 원자가 기저 상태에서 초미세 준위 사이를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이 원자초(Atomic second)다. 1초를 더 세밀한 단위로 나누는 피코 초, 팸토 초 같은 단위는 모두 원자초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를 근간으로 인간이 고안한 시간과 천문 시간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문명은 정확한 측정을 필요로하지만, 태양과 지구라는 행성에 예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문과 원자 시간 사이의 오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정할 필요가 생겨났다.
해서 1972년부터 인류는 전 세계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윤초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지구자전사업(IERS,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은 1초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원자 시간과 천문 시간 사이의 오차가 0.95초 이상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차가 생기고, 세계시를 처음 정하던 19세기로 돌아가 보자. 밤낮의 변화와 상관없이 세계 모든 곳이 단일한 시간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 파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해가 한창인 오후 땡볕을 23시로 불러야 했을지 모른다.
반대로 태양만이 유일한 시계이며, 시간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임의로 시간대를 나누고 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협정 표준시는 타협의 결과물이다. 사람들이 시간을 조정한 건 아주 오래된 일이다.
1년이 정확히 365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음력과 양력이 다르기 때문에 윤년과 윤달을 만들었다.
거기에 윤초까지. 인간은 이제 ‘6천만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다는 세슘을 대체할 새로운 시간 측정원자를 찾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터븀을 이용해 새로운 원자시계를 개발하고 있다.
인간은 머지않아 목표한 대로 1억년에 1초, 아니 100억년에 1초밖에 오차가 없는 시계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절대 시계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태양과 지구가 만드는 우주의, 조금은 제멋대로 흐르는 시간에 맞춰 더하거나 빼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