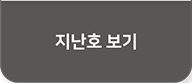과학과 문화 - 인간 따라잡는 인공지능, 언어도 마스터할까
과학과 문화는 과학과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접목,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다룹니다.


▲ 인공지능 딥드림이 그린 추상화 ⓒGoogle Deep Dream

▲ 인공지능 샤오빙이 출간한 중국어 시집 ⓒMicrosoft
글_임동욱 연구교수(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밀리고 밀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나둘 빼앗길까 결국에는 안방까지 내주게 생겼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도 박탈당할지 모른다!” 인공지능(AI)을 창조해 놓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기였던 컴퓨터가 발전을 거듭할 때 인류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비약적으로 성능이 좋아지자 오히려 위기감이 불거졌다.
인공지능 개발은 60년 넘게 진척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관심이 커진 것은 인간 고수와의 대결을 벌인 ‘딥블루 쇼크’와 ‘알파고 쇼크’ 이후다.
IBM은 1997년 5월에 슈퍼컴퓨터 ‘딥블루(Deep Blue)’를 내세워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꺾었다.
이후 2016년 3월에는 구글이 만든 알파고(AlphaGo)가 바둑 9단 이세돌을 꺾었다.
감탄으로 시작된 대중의 반응은 곧 충격으로 변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알파고를 뛰어넘는 ‘알파고 제로(AlphaGo Zero)’가 등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들을 줄줄이 굴복시켰다.
비결은 특정 작업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 덕분이다.
같은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2개 만들어 서로를 상대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규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식으로 훈련했다.
덕분에 초고수로 올라서는 데 걸린 시간은 장기 2시간, 체스 4시간에 불과했다.
바둑은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인간에 비하면 월등히 빠른 학습능력을 보였다.
까막눈 상태에서 작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세돌의 강적 ‘알파고 리(Lee)’를 따라잡았고, 그로부터 18일 후에는 2017년 5월에 중국의 바둑 9단 커제(Ke Jie)를 이긴 ‘알파고 마스터(Master)’ 버전을 앞질렀다.
이후 알파고의 모든 버전을 누르고 현존 최고가 되는 데는 22일이 걸려 총 40일 만에 바둑 신의 경지에 올랐다.
바둑에 입문한 사람이 9단까지 올라가려면 빨라야 10년이 걸리는데 알파고는 이 기간을 100분 1로 단축시킨 것이다.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 표현할 만하다.
이렇듯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고성능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면서 인공지능의 능력과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일자리가 2020년이면 180만 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단순한 작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직종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에서는 “회계사, 은행원, 법률비서, 약사 등 전문 직종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암기 능력이 필수적인 직업은 사람이 맡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가와 수도 이름을 외우는 사람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기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인간의 직업 사회는 조만간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창의성이 생명인 ‘예술’ 분야는 인공지능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
최근의 음악과 미술의 동향을 살펴보면 확신하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작곡 프로그램 에밀리 하월(Emily Howell)은 2009년 직접 음악을 작곡해 앨범까지 발매했다.
2016년 8월에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모차르트 VS 인공지능’에 초청되어 모차르트 풍의 작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에 모차르트 원곡보다 인공지능의 음악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관객은 35%로 적지 않은 숫자였다.
미술도 예외는 아니다.
구글의 미술 소프트웨어 딥드림(DeepDream)이 독자적으로 그려낸 추상화 29점은 경매에서 9만 7천 달러로 1억원이 넘는 액수에 낙찰되었다.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언어’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
언어는 상황을 판단하고 감성을 전달하는 인간적 능력의 핵심이자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와 ‘번역’이라는 교류 수단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읽어보자.
“그날은 구름이 드리운 잔뜩 흐린 날이었다. 방안은 언제나처럼 최적의 온도와 습도였다. 요코 씨는 그리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시시한 게임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여느 소설의 첫머리로 어색하지 않은 이 글은 일본 공립하코다테미래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호시 신이치 SF문학상’에 제출한 작품이다.
다른 작품도 있다.
“세상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다.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하게 중요한 이들이 있었다. 유일하게 중요한 이들이 남았었다. 그는 나와 함께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했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는 구글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중인 회귀신경망 언어모델(RNNLM) 기반의 인공지능이 창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만든 중국어판 인공지능 샤오빙(小氷)은 지난해 5월에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陽光失了玻璃窗)’를 펴내기도 했다.
직접 지은 시 139편이 실린 이 책에는 “비가 해풍을 건너와 드문드문 내린다”, “태양이 서쪽으로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다” 등 사람이 쓴 것 같은 표현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번역 분야에서의 활약도 놀랍다. 그동안 구글의 번역 서비스는 낮은 품질로 악명이 높았다.
매끄럽지 못한 글 실력을 비꼬는 핀잔으로 “구글 번역기를 돌렸냐”는 표현이 통용될 정도였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이 신경망 기계번역 시스템(GNMT)을 적용해 새로 내놓은 번역 서비스는 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우리말을 입력해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웬만한 초벌 번역의 수준을 넘는다.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들 간에는 문학 작품의 웬만한 구절을 넣어도 순식간에 매끄러운 표현을 출력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글 번역 앱은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식당의 메뉴판이나 길거리의 이정표까지도 원래 그 언어로 적힌 것처럼 실시간으로 번역해 감쪽같이 바꿔서 보여준다.
음성 기술의 발전도 눈부시다. 지난해 12월에 공개 학술사이트 아카이브(arXiv.org)에는 ‘자연스러운 텍스트-음성 변환 합성방법(Natural TTS Synthesis)’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오디오 샘플을 들어본 독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것이 사람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컴퓨터 합성인지 구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목소리 판독에 자신이 있다면 구글 검색 페이지에 논문 제목과 아카이브 사이트를 입력해서 직접 도전해 보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변방의 민족을 ‘바르바로이(Barbaroi)’라 불렀다.
어느 시대에나 인류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를 미개하거나 하등하다고 취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흉내 내도 눈치채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컴퓨터가 건네는 고차원적인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면 야만인 취급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