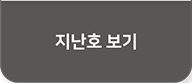자기혁신 칼럼은 회원사의 기업인, 이공계 연구원 등에게 자기혁신과 리프레시가 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자기계발 칼럼입니다.


글_오세웅 작가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르통이 뉴욕에 살 때였다.
늘 지나는 거리에 검정색 선글라스를 낀 거지가 매일같이 동냥하고 있었다.
거지의 목에 걸린 네모진 종이에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거지의 무릎 앞에는 자비를 바라는 동냥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했다.
앙드레 브르통은 거지에게 종이에 쓴 내용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거지는 좋을 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그 후 동냥 그릇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쌓였다.
거지는 대체 뭐라고 쓰였는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다.
거기에는 ‘봄이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역사적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반드시 명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험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에 부여하는 이름’이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걸출한 명언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인생항로의 축을 삼았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인이 되었든 평범하든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생각한다.
더불어 개개인의 인생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진행된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가 주어지면 노를 젓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단연코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이다.
위대함은 평범함에서 비롯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비달 사순은 부모의 별거로 네 살 때 런던의 고아원에 보내졌고 외롭고 비참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눈망울이 맑은 나이 열네 살에 이스트엔드의 미용실에서 허드렛일부터 배웠다.
미용실 오너에게 시골 사투리 영어를 쓰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틈틈이 보이스 트레이닝도 했다.
여러 곳의 미용실을 전전하면서 가위 한 자루로승부를 내야하는 현실의 절실함도 경험했다.
고생 끝에 1954년, 비달 사순은 본드 스트리트 108번가에 자신의 미용실을 오픈했다.
스물여섯 살 때였다. 첫날에 온 손님은 겨우 3명이었다.
당시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다양한 시도가 드물었으며 미용사의 사회적 지위도 낮았다.
미용사의 기술은 기계적인 손놀림이었고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비달 사순은 그 후 9년간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어떤 언어를 부여할지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는 헤어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손님의 얼굴을 분석해서 머리뼈의 골격을 추정했다.
머리뼈의 구조, 각도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훌륭한 건축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비달 사순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지오매트릭 커트(Geometric Cut, 기하학 커트)라고 불렀다.
지오매트릭 컷은 패션용어로도 쓰이는데 기하학 모양으로 재단하는 것을 말한다.
‘파이브 포인트 커트’는 비달 사순이 추구한 헤어커트의 꼭짓점이다.
머리의 균형을 살펴보고 얼굴의 적당한 지점에 두 개의 포인트를 정한다.
그리고 후두부 중앙에 한 개 포인트, 양쪽에 두 개 포인트를 정한 후 입체적으로 커트한다.
이렇게 자르면 빗으로 빗거나 손으로 쓸어 넘겨도 머리카락이 그 형태를 정확히 기억해 제자리로 돌아간다.
말하자면 'Wash & Go'다. 머리를 감고 곧장 외출해도 지장이 없다.
비달 사순은 가위 한 자루로 세상의 상식을 바꿨다.
나중에 그는 미국에 진출했고 헤어케어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미용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
그는 ‘헤어커트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조각하는 예술’이라고 자신의 일을 정의했다. 우리도 위대함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축을 찾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나만의 축은 나만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가 있듯이 나만의 언어를 갖게 되면 삶을 둘러싼 환경이 보다 윤택해진다.
그렇다면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나만의 언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한 마디로 정의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한 마디’가 포인트다.
‘세상의 모든 책을 60초 이내에 손에 넣는다.’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을 개발할 때 내걸었던 힘찬 한 마디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는 세계 각국의 유원지를 돌아보고 실망한 월트 디즈니가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원지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디즈니랜드를 구상하면서 내걸었던 한 마디다.
둘째, 모방이다. 에릭 클랩튼은 ‘모방하는 사람’이었다.
기타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지미 핸드릭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들의 블루스를 모방해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았다.
모방하는 비결은 오감을 활용해서 임장감(臨場感, Presence)을 높이는 것이다.
임장감은 마치 현장에 실제로 있는듯한 느낌이다. 말하자면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상상이다. 뇌는 동기부여가 강할수록 물 끓듯이 활성화된다.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2인칭 주어를 사용하면 객관적 시점을 유지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나폴레옹의 사진이나 그림을 바라보며 ‘네(내가 아니다)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면 마치 나폴레옹이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 같은 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나만의 언어는 시대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인 상(常)과 변(變)을 명심한다.
상(常)은 솔직함, 이타주의처럼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한다.
변(變)은 그 반대로 시대의 물결이나 상황, 조건이 바뀔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5대 사장인 장 루이 뒤마는 ‘에르메스는 시인이자 상인’이라는 말을 남겼다.
시인은 이익을 떠나 가슴을 하늘에 두지만, 상인은 철저히 땅에 발을 붙인다.
상(常)으로서 에르메스는 여전히 수작업을 고집하는 비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추구하지만, 변(變)으로서의 기업 성장과 이익이라는 날갯짓도 멈추지 않는다.
생각은 삶을 뒤흔든다. 그 삶에 옷을 입혀주는 것은 나만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