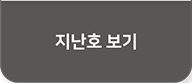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과 혁신의 길

▲ 김명자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비롯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WEF 창시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시절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꺼져 버리는 거품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수적(Exponential) 성격의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예컨대 독일은 Industrie 4.0의 기치를 내걸었고, OECD는 디지털 혁명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문명사에서 18세기 이후 기술혁명의 물결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충격은 물론 가치관까지 바꾸는 대전환을 불러왔다.
아놀드 토인비(1852~1883)는 그의 유고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 강의’(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 1884)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썼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1750~1830)은 유럽 대륙으로 퍼져 나갔고, 핵심 기술은 방적기와 역직기, 코크스 제철법, 증기기관, 공작기계였다. 하지만 미래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리스크를 무릅쓰는 기업가 정신이 더 큰 동력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 당시 직물산업 지역에서는 러드(Ned Ludd)가 이끄는 비밀결사체 러다이트(Luddite)의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난다.
정부와 기업은 초기에는 무력으로 제압하다가 사회개혁 운동으로 전환된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공장 생산체제로 바뀌고, 기업조직이 출현한다.
후반기의 철도는 생산 물량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꾼다. 중세까지는 하루 두 끼를 먹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인구가 늘면서 점심 한 끼가 더 늘어난 것이다.
2차 산업혁명(1870~1920)은 화학염료·전기·통신·정유·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기술 시스템이 혁신되고, 대기업이 기술혁신 주체로 등장한다. 기술 주도권은 영국으로부터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미국으로 옮겨간다.
19세기 초반 독일 대학개혁에서 비롯된 연구중심 대학의 출현은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그때까지는 별개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과학과 기술이 ‘과학기술’로 연결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과학에 기반한 기술(Science-based Technology)이 나타난다.
20세기 초반 대량생산의 포드주의(Fordism)와 과학적 관리(Management)의 테일러주의(Taylorism)는 현대 산업 사회가 낳은 대표적인 이념(ism)이었고, 시스템·질서·컨트롤 개념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예컨대 석유 산업의 대부 록펠러는 국가 경제의 2%에 달하는 부를 축적한다.
유례없는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 한편으론 자원 고갈 위협과 환경오염, 대형 기술 사고, 기후 위기 등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등으로 사회 병리 현상을 불러온다.
3차 산업혁명은 어땠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의 ‘산업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도래’, 경제학자 프릿츠 마흐럽(Fritz Machlup)의 ‘정보와 인적 자본의 경제학’,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등은 디지털 혁명과 지식산업이 불러오는 사회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었다.
정보통신 혁명의 시기는 분산화·분권화와 더불어 일방향성에서 쌍방향성으로, 통제에서 분산으로, 중앙집중식에서 네트워크로 가치 체계가 바뀌고 있었다.
기술혁신의 격동기마다 일인당 GDP는 급증하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특징이다.
1, 2차 산업혁명에서 주목할 것은 그 역사적 현상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학술적 용어로 정리됐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은 1906년 프랑스 역사학자 망뚜(Paul Mantoux)의 ‘18세기 산업혁명’ 출간에서 학술적 용어로 자리 잡는다.
2차 산업혁명은 1910년 영국 게데스(Patrick Geddes)의 ‘도시의 진화’에서 처음 쓰인 이후, 1969년 미국의 경제사학자 랜디즈(David Landes)의 ‘언바운드 프로메테우스’(Unbound Prometheus)에서 학술적 용어로 도입된다.
3차 산업혁명부터는 미래학자와 경제학자의 미래예측에서 예견되면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보혁명’이나 ‘네트워크 혁명’과는 다르게, 제러미 리프킨(J. Rifkin)은 2011년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의 융합을 다룬 저술에 ‘제3차 산업혁명’이란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역사학자와 미래학자 사이의 관점 차이일 수도 있고, 기술혁명의 지수적 전개의 탓일 수도 있다.
과총은 최근 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2,350명 가운데 89%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고 광범위하다. 특징은 초연결(Hyper-connected)·초지능(Hyper-intelligent)이다.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 30억 명이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상호 네트워킹 되고,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인터넷으로 초연결 될 것이라 한다.
거기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은 서로 연동되는 복합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최적의 상태로 제어되는 차원으로 진화할 것이라 한다.
MIT 교수 에드 프레드킨(Edward Fredkin, 1934~)은 우주사(宇宙史) 3대 사건으로 ‘우주 탄생, 생명 탄생, 인공지능 탄생’을 꼽았다.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특이점(Singularity)'이라면서, 그 시기를 2045년이라 예견했다. 인간의 두뇌를 추월하는 초지능의 실현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바둑계를 제패하고 은퇴한 알파고의 충격을 생생히 경험한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더 큰 것이 당연하다.
이 기회를 살려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 아마존은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난 10년 간 30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 통계국은 아마존이 14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줬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9만 명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이 실감 난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문화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의 정책기조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