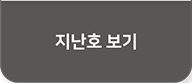과학과 문화는 과학과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접목,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다룹니다.
글_임동욱 연구교수(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지난 6월 29일 새벽 미국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비행기지에서 지름 30m 크기의 대형 기구가 부풀어 올랐다.
기구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커다란 풍선 안에 가두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장치다.
일반적으로는 열을 가해서 부력을 확보하지만 전문업체 월드뷰(World View)가 이번에 준비한 우주탐사용 기구 ‘스트래톨라이트(Stratollite)’는 소형 풍선 4만 4천 개 분량의 헬륨가스를 주입했다.
덕분에 가열장치 없이도 50㎏의 가벼운 짐을 실은 채 가뿐하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스트래톨라이트라는 이름은 성층권(Stratosphere)까지 올라가 인공위성(Satellite)처럼 관측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성층권은 대기권 중에서 10~55㎞ 높이의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는 17시간 동안 27.5㎞ 지점까지 올라갔다.
눈길을 끈 것은 기구에 실린 화물에 햄버거가 실렸다는 점이다.
패스트푸드 업체 KFC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징거버거’를 탑재해 우주로 쏘아올린 ‘징거 원 미션(Zinger 1 Mission)’이다.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다니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10월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스카이폴 작전(Operation Skyfall)’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햄버거를 우주로 보냈다.
동네 가게에서 산 햄버거와 촬영용 카메라를 헬륨 풍선에 매달아 지상 30㎞ 지점까지 올려 보냈다.
물론 대기권을 여러 층으로 구분할 때 성층권은 지상에 위치한 대류권 바로 위에 있어 엄밀히는 우주라 말하기 어렵다.
위로 계속 올라가면 중간권, 열권, 외기권을 지나야 진정한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중간권만 가도 우주에서 유성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다가 성층권에서도 희뿌연 지구 대기와 어두운 바깥층이 구분되기 때문에 흔히들 우주라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 높이까지 물건을 올려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13년에는 고등학생이 각각 헬륨 풍선에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매달아 성층권까지 올려 보내 촬영을 하고 낙하산을 이용해 무사히 착륙시켰다.
스트래톨라이트는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있어 정확한 위치로 띄워 보낼 수도 있다.
문제는 ‘수취인’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편물이나 화물을 보내면 받는 사람을 적는다.
그러나 성층권에는 물건을 받을 이가 없다. 우주로 쏘아올린 화물의 수취인은 누구일까.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적은 화물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경우도 있다.
1998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16개국이 뜻을 모아 우주 공간에 정거장을 짓기 시작했다.
수많은 계획 변경과 공사 취소가 있었지만 작업은 계속되었고, 지금은 길이가 100m를 넘고 무게가 400t에 달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만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화물을 실은 우주선이 발사되었다. 자세 제어를 위해 매년 10t 가량 필요한 추진연료도 지상에서 지속적으로 쏘아 올린다. 화물을 운반하는 우주선도 여러 종류다.
대표적으로는 러시아가 개발해 매년 6회 정기적으로 발사되는 ‘프로그레스(Progress)’ 화물우주선이 있다.
여기에 사람이 탑승할 자리를 만들면 ‘소유즈(Soyuz)’ 우주선이 된다.

ISS에는 평소에 6명의 승무원이 교대로 거주하는데 이들을 보내고 귀환시킬 때 소유즈를 사용한다.
프로그레스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은 ‘에이티비(ATV, Automated Transfer Vehicle)’라는 새로운 화물우주선을 개발하기도 했다.
우주선은 건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보다 여러 차례 재활용하는 편이 낫다.
미국이 개발한 우주왕복선은 말 그대로 우주에 나갔다 지구로 되돌아오는 왕복 여정이 가능하다.
1980년대부터 ‘디스커버리’, ‘챌린저’, ‘콜롬비아’, ‘인데버’ 등이 활약해 왔으며 사람과 화물을 모두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사 1회당 비용이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해 논란이 많았고 몇 차례의 폭발사고까지 있어서 2011년 ‘아틀란티스’를 마지막으로 운용이 종료되었다.
최근에는 화물우주선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왕복선에 쏟아붓던 예산을 민간 화물우주선 쪽으로 전환시켰다.
덕분에 민간기업의 우주로켓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Elon Musk)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라이벌 관계다.
머스크는 스페이스엑스(SpaceX)를, 베조스는 블루오리진(Blue Origin)을 각각 설립해 화물우주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의 공통점은 우주왕복선처럼 여러 번의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다.
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쏘아 올린 후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지구로 되돌아와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식이다.
두 회사는 이미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스페이스엑스는 우주로 나갔던 수직형 로켓 발사체를 다시 발사 자세 그대로 지상에 착륙시킨 바 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발사체 ‘팰컨나인(Falcon 9)’이 통신회사 이리듐이 사용할 통신위성 10기를 싣고 우주궤도까지 올라갔다가 7분만에 되돌아와 바다 위 바지선에 착륙했다.

평평한 땅 위도 아닌 출렁이는 바다에서도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다.
기존에는 회당 200억 원에 달하던 발사비용도 10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격적인 상업용 화물우주선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블루오리진은 우주관광이 주된 목적이다.
6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우주왕복선의 상승고도에 육박하는 100㎞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스페이스엑스보다 빠른 2015년 11월에 이미 발사 후 귀환 임무를 성공시킨 바 있다.
차후에는 화물 운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두 회사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었고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 냈다.
최근 중국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 1,200㎞ 떨어진 거리까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통신 속도로 따지면 기존의 1조 배에 달하는 이른바 ‘양자통신’이다.
그러나 실제 메시지를 보내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예정이고, SF영화에서처럼 물건을 순간이동 시키는 데는 몇 백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반면에 우주로 화물을 보내는 기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 상용화 단계에 다다랐다.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중에서 우주로 물건을 보내야 하는 위성 산업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앞으로 달과 화성에 유인기지가 건설되면 우주로 화물을 보낼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각국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성본체, 탑재체, 발사체, 엔진, 탐사장비 등 우주 화물과 관련된 기술이 대부분이다.
지구에서 보낸 우편물이 먼 우주의 수취인에게 무사히 도착하는 미래의 상황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