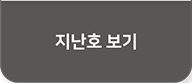자기혁신 칼럼 - 인생을 바꾸는 수첩 활용법
자기혁신 칼럼은 회원사의 기업인, 이공계 연구원 등에게 자기혁신과 리프레시가 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자기계발 칼럼입니다.
글_ 오세웅 작가
‘올해는 꼭 해야지!’라고 다짐했건만 벌써 3개월이 후딱 지나갔다.
이러다가 작년, 재작년처럼 어영부영 작심삼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시간은 토끼처럼 빠르고 행동은 달팽이처럼 더디다.
올해도 새로 산 수첩을 들쳐 본다. 1월은 그나마 빽빽하게 적혀 있지만, 2월부터 듬성듬성 공백이 늘어났고, 3월은 빈칸이 압도적으로 많다.
매년 필요해서 수첩을 구입하지만, 생각해보니 수첩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이러다 주인을 잘못 만난 수첩은 연말이면 애물단지로 변해 쓰레기통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닐까.
매번 ‘생각’만으로 끝나기에, 의지력이 부족한 자신을 탓한다. 미루기만 하는 습관을 좀체 바꾸지 못한다.
수첩의 목적은 뭘까. 왜 사람들은 수첩을 사용할까. 수첩도 역사가 있다.
1세대 수첩은 회사용, 조직용이었다. 그 목적은 회사의 생산이나 영업 스케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일정은 그 안에 들어갈 틈도 없었고, 사실 적어 넣을 필요도 없었다.
2세대 수첩이 등장하면서 개인적인 일정을 적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적었고, 빠지지 말아야 할 결혼식 날짜를 잊지 않으려고 적어 넣었다.
하지만 1세대 수첩과 마찬가지로 수첩의 구성은 거의 동일했다.
수첩을 펼치면 연간 스케줄과 월간 스케줄, 그리고 날짜에 딸린 조그만 칸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뒤편에는 예외 없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었다.
3세대 수첩으로 넘어오면서, 수첩에 자신의 목표를 적겠다는 붐이 일어났다.
프랭클린 플래너가 그 앞장에 섰다. 수첩에 꿈을 적고 그 꿈이 실현되려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부추겼다.
비슷한 수첩들이 연달아 시중에 출시되었다. 3세대 수첩의 구성도 2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첫 장에 목표와 꿈을 적게 해줌으로써 수첩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해주었다.
수첩을 펼치면 1년의 날짜가 나오고, 월간, 주간 날짜가 적혀 있는 나머지 구성은 비슷했다.
다만 1일, 1주일, 한 달을 ‘시간 관리’ 하기에 좋게 구분해 주었다.
반면에 수고한 값은 고스란히 수첩 가격에 반영되었다.
최근 들어 수첩은 순수한 개인주의 지향의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목적별로 수첩이 따로 있다. 여행용 수첩, 요리용 수첩, 산악용 수첩, 그림용 수첩을 비롯해 방수가 되는 서바이벌 수첩이 있다.
프로젝트 수첩, 강의용 수첩, 그 밖에 직접 만들어서 쓰는 수첩도 있다.
사실 단순한 일정 관리나 기록을 위해서라면 스마트폰, 태블릿이 훨씬 편하다.
검색도 쉽고 손쉬운 편집이나 인쇄가 가능해서 수첩이 따라오기 힘들다.
그런데도 수첩은 없어지지 않는다.
수첩도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첩을 좀 더 쓸모 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 장을 펼치면 보통 연간 캘린더가 먼저 등장한다. 새해 들어 1년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처음엔 야심찬 계획을 수첩에 빼곡히 적는다. 그러나 그 후부터 지리멸렬해진다.
계획은 적혀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전혀 적혀 있지 않다.
머릿속의 설계도만으로 집을 지을 순 없듯이 수첩도 마찬가지이다.
계획(설계도)을 토대로 집을 짓는(목표) 과정이 수첩에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
수첩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그 안의 세포가 싱싱해야 한다.
수첩의 목적은 ‘결과’다. 먼저, 계획(Plan)을 세운다. 그 계획대로 실행(Do)한다.
막상 실행해 보니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당연히 책상에서 세운 계획과 현장 실습은 다르다. 그래서 점검(Check)을 통해 그것을 다시 계획 내용에 반영(Action)한다.
이처럼 수첩은 ‘PDCA’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비로소 자기 몫을 한다. 1일 계획도 좋고, 1주간 계획도 상관없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면 그 결과를 곰곰이 따져보는 공간적 장소가 수첩이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북극성이 수첩이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실행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찾아내서 다시 재도전하는 과정이 수첩에 모두 적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수첩도 결과가 되려면 마땅히 행동이 따라야 한다.
때로는 행동을 못할 때가 있다.
그 이유로는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거나, 할 마음이 없거나, 비전이 없어서다.
모두 그럴 듯한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즉, 별도의 지식을 끄집어내서 변명거리로 만들어준다.
A라는 원인이 있기에 B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에는 ‘하겠다!’는 각오가 필수적이다.
그 각오야말로 행동하게 만든다. 과거는 후회덩어리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후회, 하지 않았던 후회가 압도적으로 가슴을 후려친다.
행동하겠다는 각오야말로 후회 목록을 이전보다는 훨씬 얇게 해줄 수 있다.
행동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먼저 자신이 변한다.
자신이 변하면 주위도 변한다.
행동함으로써 변화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따른다.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수가 많다.
왜 생각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공상과 생각은 다른다.
공상은 머릿속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생각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과정이다.
즉, 생각은 ‘결론’을 내는 것이다.
변화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제패하면 결론을 제패한다.
결론은 꼭 하고 싶다는 목표와 직결된다.
즉, 생각은 목표를 만들어낸다.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수첩에 적는다.
씨(Seed)를 뿌리는 작업이다.
장거리 목표도 있겠지만, 단거리 목표를 쌓아가는 게 큰 효과를 볼 때가 많다.
수첩에는 90일 간격의 목표가 바람직하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한다.
‘매일’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다. 매일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공상과 멀어지게 해준다.
수첩에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꼭 적는다.
이 점이 수첩의 묘미다.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에 매진하는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수첩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한다.
1주간이 지나면 매일 이루어 놓은 결과를 체크해서 부족한 것, 채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새롭게 도입할것을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다.
계획을 세우고(Plan), 실행하고(Do), 그 실행에 대해 체크하고(Check), 수정된 계획을 새롭게 도입(Action)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첩에 고스란히 나타나야 한다.
매일 그렇게 함으로써 수첩을 생생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수첩은 ‘결과’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준다.
수첩은 설계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직접 땀 흘려 자신이 원하는 꿈의 궁전을 짓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한다.
잘못 되었으면 고치고, 모자라면 채운다.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과감히 도입한다.
적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수첩은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
그 존재의 목적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