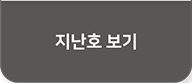특수효과로 관객을 사로잡는 뮤지컬과 공연의 무대기술
과학과 문화는 과학과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접목,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다룹니다.
글_ 임동욱 연구교수(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공연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모여 앉은 관객들 앞에 약간 높은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 배우나 가수가 올라와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그러면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저절로 박수를 친다.
그러나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은 사람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술과 결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무대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기계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말에 시작된 ‘영상기술’이다.
기계를 이용한 무대기술의 원조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에서 찾을 수 있다. 문학이나 연극의 스토리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기계장치에 의한 신(神)’이라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연극이 주된 공연예술이었다.
관객이 들어찬 극장에서 이야기를 한참 진행시키다가 모든 사건을 엮어서 멋지게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지면, 작가는 도르래 장치에 배우를 매달아 무대에 투입시켜서 마치 신이 강림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신이 내려오셨으니 인간들의 모든 논쟁은 무의미해지고 연극은 급하게 마무리된다.
이러한 기법을 당시에는 ‘아포 메카네스 테오스’라 불렸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다.
스토리가 빈약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지만 기계기술을 무대에 도입한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후에도 기계장치를 활용해서 무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근대까지도 주로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무대 뒷벽의 배경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수준이었다. 현대에 접어들어 전자제어 장치가 등장하면서 기계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요즘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은 ‘무빙워크’, ‘크레인’, ‘로봇’이다. 그중에서 무빙워크는 바닥 자체가 움직이는 장치로서 역동적인 장면을 보여줄 때 사용한다. 무대 밖의 스태프가 책상이나 의자 같은 소품을 올려놓으면 정해진 위치로 옮겨준다.
뮤지컬 ‘고스트’에서는 춤추며 노래하는 배우가 올라타서 순식간에 옆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걷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뮤지컬 ‘명성황후’에서는 무빙워크를 나선형으로 만들어 중심부를 들어 올려 언덕을 만들었고 오르막길을 뛰어오르며 칼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크레인은 주로 대형 극장에서 사용한다. 전자식 콘트롤러에 연결된 수십 개의 크레인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여기저기 움직이며 물건을 내려놓고 또 들어올린다.
끝부분에 집게나 갈고리가 달려 있어 소품을 쉽게 집어들 수 있다.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는 조명을 잠깐 끄고 배경과 소품 전체를 바꾼다.
이때 발소리나 인기척이 없는데도 무대가 바뀌는 것도, 장롱과 소파가 사라진 자리에 벽면이 세워지고 거대한 구조물이 순식간에 놓이는 것도 전자식 크레인의 활약 덕분이다.
때로는 물건 대신에 사람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뮤지컬 ‘헤드윅’에서처럼 크레인 끝에 조명을 달아 무대 위를 밝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로봇을 내세우는 뮤지컬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크레인도 어떻게 보면 로봇 팔 형태의 일꾼이지만 요즘 로봇은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한다.
로봇 하면 뻣뻣한 동작을 연상하기 쉽지만 뮤지컬 ‘드래곤 길들이기’를 관람하면 요즘 로봇 기술을 재평가하게 된다.
사람보다 몇 배나 큰 용이 등장해서 날갯짓을 하고 불을 뿜으며 눈이나 입을 세밀하게 움직여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움직임도 부드러워서 ‘혹시 살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자연스러운 동작의 거대 로봇이 등장한 사건으로는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꼽는다.
당시 주경기장에는 봅슬레이를 타는 곰 ‘폴라베어’, 스노보드를 즐기는 표범 ‘레퍼드’, 춤을 잘 추는 산토끼 ‘헤어’ 등 3가지 마스코트가 커다란 몸집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며 입장을 해 화제를 모았다.
프랑스 서부 도시 낭트에서는 코끼리와 거미 모양의 거대 로봇을 만들어 시내를 활보시킨다.
큰 소리를 내며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이 로봇들은 매년 행사 때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계기술과 더불어 공연 장르에서 무대를 화려하게 꾸미는 방법으로 ‘영상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 물체가 아닌 이미지만으로 입체감을 주는 효과를 가리킨다.
영상을 이용한 무대기술의 출발점은 1792년 12월 마술사 폴 필리도르(Paul Philidor)가 프랑스 파리에서 보여준 ‘팡타스마고리(Fantasmagorie)’ 쇼로 볼 수 있다.
여러 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후 어두운 무대 위 여기저기에 세워두고 불빛을 비춰서 마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1802년에는 영국 런던으로 퍼져가 ‘판타스마고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곧 유럽 전체에서 유행했다.
유령 같은 형체(Phantasma)들이 특정 장소에 모인다(Agora)는 의미의 신조어다.
이 기술은 19세기의 발명가 존 헨리 페퍼(John Henry Pepper)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한다.
페퍼는 1862년 찰스 디킨슨의 소설 ‘유령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에서 무대와 관객 사이에 커다란 유리판을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설치했다.
무대 아래나 옆면에 숨겨진 공간에서 유령 옷을 입은 사람이 연기를 펼치고 밝은 빛을 비추면, 관객들은 실제 배우가 아닌 유리에 반사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마치 유령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이 기법은 ‘페퍼의 유령(Pepper’s Ghost)’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기술은 현대에 들어와 ‘플로팅 홀로그램(Floating Hologram)’ 즉 떠다니는 홀로그램이라는 기술로 발전했다. 배우와 관객 사이에 망사 형태의 막을 내리고 그 위에 입체영상을 투사하면 실제 사람이 서 있고 움직이고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홀로그램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물체를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르게 푸리에 방정식 등 수학적 변환을 통해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덕분에 기록 원판이 손상되어도 전체(Holo) 모습이 드러나는 표현물(Gramma)이라는 뜻에서 홀로그램이라 불린다.
1948년 헝가리 출신의 영국인 물리학자 데니스 가보어(Dennis Gabor)는 특정 물체에 레이저 광선을 쬔 후 반사되고 회절되는 값을 계산해 다른 곳에서도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홀로그램 공식을 찾아냈다.
그러나 페퍼의 유령에서 발전한 플로팅 홀로그램은 2차원 막 위에 입체처럼 보이는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이다. 진정한 홀로그램이라 말하기는 어려워 ‘유사 홀로그램’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도 발전을 거듭한 덕분에 공연무대에서는 실제 사람이 등장한 것 처럼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1996년 사망한 힙합가수 투팍(2PAC)이 동료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등장하는 플로팅 홀로그램 쇼를 만들어 관객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대문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홀로그램 전용 공연장 ‘케이라이브(K-Live)’에서 소녀시대와 싸이 등의 케이팝 가수들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풍부한 감정을 이끌어낸 무대기술.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오래도록 지켜보고 기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