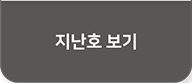과학과 문화 - 랜드마크를 빛내는 미디어 파사드 기술
과학과 문화는 과학과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접목,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다룹니다.
글_ 임동욱 연구교수(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덕수궁 석조전 미디어 파사드 포스터

▲ 파리 앵발리드 안뜰에서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 쇼 ‘앵발리드의 밤’

▲ 샤르트르 대성당의 미디어 파사드 쇼 ‘빛 속의 샤르트르’

▲ 르망 대성당의 미디어 파사드 쇼 ‘키메라의 밤’
에펠탑, 타워 브리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부르즈 칼리파, 동방명주(東方明珠) 이름만 들어도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Landmark)라 부른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어 고유의 경관을 만들어낸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Churchill)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건축물을 재건하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곧이어 건물이 우리를 빚어낸다”는 명언을 남겼다.
랜드마크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소로 랜드마크를 꼽았다.
우리도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랜드마크도 지역의 경관을 만들어낸 요소로 인정한다.
특정 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대표적인 건축물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랜드마크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빛을 쏘아서 야간 경관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파사드(Façade) 즉 건물의 외벽을 일종의 미디어(Media)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라 한다.
서울을 예로 들면 남산의 N타워에 색색의 조명을 밝히는 것도, 백화점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미디어 파사드의 일종이다.
랜드마크는 해당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해서 미디어 파사드의 주요 배경이 된다.
어두운 밤에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대형 건축물은 행인들의 시선을 끌고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일도 생긴다. 랜드마크의 후보로는 새로 지은 건물이나 오래된 역사유적이 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축 건물은 설계와 시공 당시부터 조명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역사유적은 보존과 훼손의 문제로 전기 설비를 부착하기가 어렵다.
올해 여름 문화재청은 덕수궁 석조전과 경복궁 광화문 등 서울 곳곳의 역사유적을 미디어 파사드에 활용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여기에 쓰인 기술은 미디어 파사드의 역사 중 가장 최근에 속하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이다.
건축물에 조명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진 곳에 프로젝터(Projector)를 설치하며, 창문이나 기둥 등 건물 외벽의 다채로운 표면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일종의 지도(Map)를 만들고 그에 맞춰 영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오래된 건물을 신축 당시의 모습으로 잠시 되돌리기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덧씌워 겉모습을 탈바꿈시키기도 한다.
예전의 직접 조명에 비하면 화재와 훼손의 우려가 훨씬 적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혔다.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특정 행사를 개최할 때 장소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궁에 빛을 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역사유적으로 야간 경관을 만들어내는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답을 찾으려면 그 출발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 파사드를 일종의 쇼(Show)로 여기고 현대적 전기 조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로 프랑스를 꼽을 수밖에 없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1879년 백열전구를 상용화시키기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전기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시도되었다.
마술사 장외젠 로베르우댕(Jean-Eugène Robert-Houdin)은 1863년 백열전구를 설치해 저택의 외벽에 빛을 밝혀 쇼를 선보인 바 있다.
최초의 미디어 파사드 쇼는 1952년 5월 30일 파리에서 남쪽으로 180㎞ 떨어진 샹보르(Chambord) 왕궁에서 펼쳐졌다.
건물의 안팎에 야간 조명을 적용하되 내레이션과 음향 효과까지 결합시켜 본격적인 볼거리로 만든 사람은 마술사 장외젠의 손자 폴 로베르우댕(Paul Robert-Houdin)이었다.
할아버지의 업적을 듣고 자란 폴은 전기 조명의 발전을 지켜보았고 스테레오 음향 기술이 발명되자 이를 결합시켜 처음으로 조명, 음향, 음악이 하나로 합쳐진 미디어 파사드 쇼를 만들어냈다.
로베르우댕의 쇼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프랑스 전역에서 기술 문의가 이어졌으며 몇 년 뒤에는 이집트, 그리스, 튀니지 등 유럽에서 비교적 가까운 국가들도 프랑스의 기술자를 초빙해 랜드마크에 조명을 밝혀 쇼를 기획했다.
당시 신문에서 ‘소리와 빛의 무도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것이 미디어 파사드 쇼를 뜻하는 프랑스어 명칭 ‘송에뤼미에르(Son et Lumière)’가 되었다.
송에뤼미에르가 독창적인 장르가 된 것은 역사유적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어느 유적이든 고유한 이야기를 간직하기 마련이다. 관련된 사건을 해당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일반적인 위치를 공간(Space)이라 부른다면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곳은 장소(Place)라 부른다.
역사유적의 특징을 극대화시킬 때 우리는 ‘장소성(Placeness)을 살려냈다’고 표현한다.
로베르우댕은 역사유적에 얽힌 전설과 실제 이야기를 극본으로 만들고 이를 조명과 음향기술과 결합시켜 스토리텔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후 송에 뤼미에르는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로 장소성을 극대화시켰다.
송에뤼미에르는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치면서 마침내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결합했고 더욱 화려하고 정교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매년 여름이면 성당, 궁전, 저택 등 지역이 보유한 역사유적에 프로젝션 매핑을 적용하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선보인다.
파리는 앵발리드 건물의 역사적 사건을 되짚어보는 미디어 파사드 쇼 ‘앵발리드의 밤(La Nuit des Invalides)’을, 샤르트르는 대성당을 중심으로 중세와 근대를 회상시키는 ‘빛 속의 샤르트르(Chartres En Lumière)’를, 영국을 지배한 플랜태저넷 왕조의 발상지 르망은 양면적인정체성을 드러내는 ‘키메라의 밤(La Nuit des Chimères)’을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소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도시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는 것도 특색 없는 도시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이 크다.
서울의 덕수궁과 경복궁이 문화재에 비교적 피해를 덜 주는 프로젝션 매핑기술을 채택했음에도 지적을 받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란하고 복잡한 컴퓨터그래픽 영상이 역사 유적 고유의 이야기와 장소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관객들의 몰입과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프랑스의 송에뤼미에르에서 미디어 파사드의 핵심 비결을 찾아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