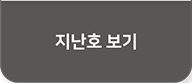생활 속 과학탐구 - 구석기 화가들의 팔레트
생활 속 과학탐구는 일상생활 속 물리학, 첨단과학, 과학일반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이라 하면, 너무 먼 옛날이라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시점이다. 고작 백년, 아니 십년 전 기억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때를 더듬기란 어렵다.
하지만 3만 년 전 그들은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수만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도달해 거침없이 심장을 두드린다. 구석기 유럽 화가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보자.
글_ 이소영 과학칼럼니스트
사진협조_광명시청
라스코, 알타미라, 쇼베 등 남프랑스와 스페인 일대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의 화풍은 대개 일치한다.
한 동굴의 그림은 소수의 화가가 그렸을 테고, 세월을 두고 여럿이 그린 경우에는 화풍을 배워 익히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한 명의 화가가 그렸으리란 추정도 있다. 설사 그린 사람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작업 전체를 혼자 했을 리는 없다.
동굴 속은 어둡다. 그림은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동굴의 깊숙한 구석까지 그렸으니 적어도 등불을 든 동료가 필요했을 것이다. 등불, 그렇다. 그 동굴벽화들은 불이 있어 가능했다.
불을 이용해 색을 만들다
인간이 불을 사용한 최초의 순간은 언제일까? 지난 2012년 캐나다 토론토대학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북부 동굴에서 약 100만년 전의 동물 뼈와 석기, 식물의 재 등을 발견했다.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했다고 보이는 가장 오래된 흔적이다. 벼락이나 자연이 놓은 산불 등 인류에게 불은 우연으로, 주술처럼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왔으리라.
인간은 그 불을 가두어 어둠을 밝히고 동물을 쫓고 밥을 짓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
구석기 벽화에서 발견되는 색은 주로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그리고 거기서 변형된 갈색이나 보라색 등이다.
붉은색이라도 하나가 아니라 다채로운 색감을 보이는데 그것은 구석기의 화가들이 안료의 성질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 안료를 조절하고 다루는 기술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불은 이 안료들의 색감을 풍부하게 하는 결정적 도구다.
대체로 검은색은 망가니즈, 숯 등이 재료다. 나무를 태운 숯과 태운 뼈 등의 재료는 불 그 자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다만 숯의 경우 횃불이 타고 남은 흔적인지 안료로 만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붉은색에선 그 색을 내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조작한 인간의 행위를 확신할 수 있다.
붉은색에 관한 인간 종족의 애호는 상상보다 더 오래되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150만 년 된 유적지에서도 문지르면 붉은색이 나는 현무암 조각이 발견된 바 있다. 붉은색은 태양과 피, 즉 생명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여겨졌으리라 짐작해본다.
애초에 붉은색이 나는 광물이 수집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진정한 마법은 붉은색을 만드는 불의 능력에서 시작된다. 황토를 불에 가열하면 더 붉은색으로 변한다.
황토를 불로 가열해 가공하는 행위는 40~30만 년 전 아슐리안 문화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시기 유적에서 발견된 가열한 황토 덩어리에는 갈아서 가루를 내거나, 어딘가에 문질러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얼굴이나 몸에 문질러 색을 칠하거나 영역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그 자체로도 마법 같은 존재인데, 노란 흙을 생명의 색인 붉은 빛으로 바꾸는 마법을 행하기까지 한다.
반대로 열을 가한 적철석을 흰색을 내는 광물과 혼합해 주황색 등 다채로운 톤을 만들어 냈다.
라스코 벽화에서는 붉은 산화철을 열처리해서 노란색과 보라색을 얻은 흔적이 남아 있다. 라스코 벽화의 ‘검은 소’ 아래쪽에 칠해진 보라색은 망간과 적철석을 혼합해 열처리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석기 화가들은 방해석과 이산화망가니즈를 혼합해 회색을 만들었다. 21세기에도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는 보라색 과망가니즈산칼륨(KMnO₄)의 산화-환원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망가니즈의 색 변화는 여전히 신기하다.
갈철석(Limonite)이 황토, ‘오커(Ochre)’ 색의 주 원천이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붉은색이 된다. 이 안료를 사용한 최초의 흔적은 30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로 석기 시대 전반에 걸쳐 동굴벽화와 다양한 인공물을 채색한 재료다. 갈색 색소인 ‘암버(Umber)’ 역시 불을 만나면 다양한 색감을 낼 수 있다.
열을 가하면 밤 껍질처럼 짙은 갈색이 된다. 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는 ‘셰나(Sienna)’도 본래 노란 빛이 도는 갈색이지만, 열을 가하면 적갈색이 된다. 열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색감을 얻을 수 있어 적갈색에서 지푸라기 색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불은 나무를 태워 검은색을 내는 숯을 만들고, 자연에서 얻은 흙과 광석에 미묘한 색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스코 동굴벽화에 남은 색의 향연은 불이 만들어낸 것이다.
유화물감·원근법··· 동굴벽화 속에 이미 다 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 앙드레 르루와 구랑은 석기 시대 사람들의 거주지가 붉은 황토로 뒤덮인 곳이었으리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흙의 두께가 20센티미터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양이 었으리라 봤다. 주재료인 황토나 적철석, 망가니즈 등 쉽게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작업한 건 아닌가보다.
라스코 동굴벽화에 사용된 짙은 갈색을 띄는 희귀한 색들은 산화망간 광물 중 하나인 ‘버네사이트(Birnessite)’나 ‘토도로카이트(Todorokite)’를 이용했으리라 보는데, 동굴 주변에서는 발굴되지 않는 성분이다.
이 광물은 라스코 동굴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수해 왔으리라 추정된다.
도시 빌딩 숲에 갇혀 살다보면 인류가 대단한 발전을 한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은 이미 인류가 등장한 초기에 만들어졌다. 요리, 옷, 연장, 예술 역시 마찬가지다.
구석기 화가들은 이미 3차원 조각에 능숙했고, 벽면의 굴곡을 이용해 원근감을 표현할 줄 알았다.
머리나 다리가 여럿으로 그려진 동물 그림을 이어 보면 오늘날의 애니메이션과 다를 바 없다.
그밖에 점묘법, 스텐실 기법 등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또 여러 도구를 만들었다. 높은 곳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다리와 비계(飛階)를 설치했고, 크레용과 붓을 만들었다.
여러 종류의 첨가제를 이용해서 물감을 만들어냈다. 그림의 균열이나 건조를 막기 위해 보존제를 사용했다. 동굴을 방문한 뒤 “그들이 모든 걸 발명했군.”이라 말했다는 피카소의 심정이 십분 이해되지 않는가.
현재 광명동굴에서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라스코 동굴벽화 순회전(~9월 14일)을 열고 있다. 구석기인들의 삶을 엿볼 흔치 않은 기회가 가까이 있다.
첨단 과학과 보존 전문가들이 2만년 전 동굴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