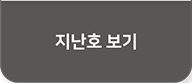인문학 칼럼 - 반 고흐가 남긴 예술과 편지

글_ 박은몽 소설가
인문학 칼럼은 다양한 인문학적 정보와 콘텐츠를 깊이있게 다루어 읽을거리와 풍성한 감성을 전달하는 칼럼입니다.
겨울 내내 전쟁기념관에서 < 반 고흐, 10년의 기록전 >이 계속되었다.(2월 8일까지)고흐는 뒤늦게 그림을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예술혼을 불사르다 요절한 천재이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총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 남프랑스 아를에 머무르던 마지막 몇 년, 그의 정점을 이루면서 < 해바라기 >, < 별이 빛나는 밤 > 등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굳이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화가이다.
그의 그림은 평론가의 평론조차 필요하지 않다. 형이상학적인 해설이나 분석도 필요하지 않다.
예술을 깊이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흐만의 색깔, 고흐만의 터치가 단순히 기법의 경지를 넘어 화가가 느꼈을 고독, 그림에 대한 치열한 열정 등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어떤 이에게는 예술이 놀이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고흐에게 예술은 전 생애, 전 영혼을 걸고 자신을 불사르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와도 같았다.
그가 처음부터 화가가 되기를 꿈꾼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열정에 심취하여 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했다.
한때는 신학공부를 하였고, 전도사로서 탄광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다른 기질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면서 평탄치 못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다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스무 살이 넘어서였다.
물론 그때까지 미술과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숙부 세 사람이 모두 화상(畫商)이었기 때문에 미술품 매매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예술품을 돈으로 환산하여 오가는 거래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 해고되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 화가로서의 길을 찾은 고흐는 오래 기다린 만큼 몇 갑절의 열정을 그림에 쏟아 부으면서 길지 않은 화가의 생을 불살랐다.
혹한 속에 피어난 ‘노란 해바라기
고흐는 37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작품만큼이나 의미가 깊은 편지를 남겼다.
네 살 터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600통이 넘는 편지는 서가문학으로서도 귀중한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
테오는 숙부들처럼 화상 일을 하고 있었고 형 고흐에게 그림에 집중하라고 독려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실 테오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고흐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고흐 본인도 그러한 고마움을 편지에 표현하곤 했다.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네가 보내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
고흐의 예술이 정점에 달한 시기는 남프랑스인 아를로 옮기면서부터였다. 그의 색채는 활기차고 강렬해졌고 그의 붓터치 역시 고흐만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친구 고갱과 함께 살면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고갱을 기다리면서 여러 편의 ‘해바라기’를 그렸다.
고갱과 같이 쓸 작업실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었다. 1888년 고흐는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무 급하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감정이 충만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 글을 쓸 때 문장이 술술 나오는 것처럼 - 항상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이 지나면 무거운 날들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공허한 날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일해서 작품을 남겨야 하는 거야.”
마침내 그해 10월 말. 고갱이 아를로 내려와 고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고흐는 고갱을 무척 사랑했지만 결코 두 사람의 관계가 평탄치는 못했다. 어쩌면 그런 불안정함은 고흐의 날선 감수성이 지닌 운명과도 같았다.
상처 입기 쉬운 영혼, 끝없는 고통
고갱과 고흐의 동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처음부터 충돌의 연속이었고 그해 12월 23일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고흐는 면도날을 들고 고갱을 위협하다가 결국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고는 마을 사창가로 달려가 레이첼이라는 창녀에게 “이 오브제를 잘 보관하라”며 잘라낸 귀를 건네주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고흐가 두려워한 대로 고갱은 결국 고흐를 떠났고 고흐는 다시 혼자 남겨져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정신병원을 드나들어야 했다.
1889년 1월. 정신병원에서 돌아온 고흐는 고갱을 생각하며 다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고 동생 테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다시 확고한 정신 상태로 작업에 임하고 있단다. 황금이라도 녹여버릴 것 같은 그 열기를, 해바라기의 그 느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말이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집중한 상태에서 한 개인의 전부를 쏟아 부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느낌이지.”
극도의 상심과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림을 그려나갔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불사른 열정이었다. 평생을 따라다닌 정신병은 그를 끝까지 놔주지 않았다.
그는 점점 그림조차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사실은 그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1890년 7월 27일 37세의 천재는 들판으로 걸어가 자신의 가슴을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황급히 달려온 테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면서 “고통은 영원하다(La tristesse durera toujours).”는 말을 남겼다.
고흐 스스로 남긴 말처럼 그는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평안과 영화를 누려보지 못한 채 평생 가난과 정신병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의 예술을 알아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후 2년이 지난 무렵 회고전이 열렸고, 1913년부터 그에 대한 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온 영혼을 불살라 그린 그의 그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도 화가로서도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만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빛을 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