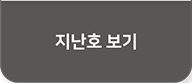특별기획 - 창조경제시대 기업의 기술혁신





패널토론에서는 창조경제시대 기술혁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혁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은 각각 어떻게 확립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패널리스트와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가인 학계 패널리스트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박동철 _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경제, 한국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조의 가장 핵심 개념은 섞이는 것, 기존의 것들을 잘 결합 · 융합 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소통을 위해 정부가 할일은 정보, 산업, 물자가 잘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것들을 섞느냐는 민간기업이 할 일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이 할 일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를 보면, 정부 방침을 잘 이루기 위해 여러 정책을 폈는데, 특히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모든 물자와 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성공한 게 별로 없다. 전 기차도 과거 정부에서 육성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특정 산업, 산업 생태계를 제시하지 않는 게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것 같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도 창조경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다.
짧은 기간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다른사업을 찾는 행위는 산업 발전에 있어 결코 이롭지 않다.
경제를 이루는 요소로 시스템, 프로세스, 제도, 문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이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투자라든지,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만 사람 내지 조직 문화, 소통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람과 문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과학기술자들에게 돈 되는 기술을 만들라고 하기보다 정말 인간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내길 독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홍 _
창조경제를 기업 관점과 국가 관점으로 나누어 볼 때, 두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시장 및 소비자와 연계되지 않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창조의 개념을 영단어로 풀자면, Newness와 Usefullness이다. 즉, 새로워야 하고, 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창조는 독창성에 목말라 있을 뿐, 유용성과는 거리가 있다.
창조경제에 있어 융복합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IT와 NT, CT의 결합 등 말은 멋지다.
하지만 멋있는 기술보다 소비자와 시장에 팔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먼저, 기업 관점에서 기술의 유용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삼성전자가 시장이나 소비자를 이해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보르도 TV나 갤럭시 노트를 만들면서부터이니 말이다.
국내 대기업이 이 정도니 다른 기업은 어떨까? 대부분의 연구소는 소비자와 격리되어 있다.
연구소에서 TV를 개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연구소에서는 먼저 타사의 TV를 분석한다. 휘도, 밝기, 선명도, 두께 등을 파악하고, 그 후 그 제품에서 밝기를 올리든, 선명도를 올리든지 하는 특성치를 올려 새로운 제품이라고 시장에 내놓는다.
소비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특성치를 올려 제품을 개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게 한국 산업의 현주소다.
연구개발 자체가 소비자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비꼬는 단어가 바로 ‘스웨덴 패러독스’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R&D에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국가로 유명하다. 그러나 GDP 성장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R&D에 대한 투자가, 시장에 나가 팔리고 GDP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웨덴보다 훨씬 더 큰 패러독스를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반면, R&D를 안 하기로 유명한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애플사는 R&D에 힘쓰는 대신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슬림한 디자인이 가능한 감전식 터치스크린을 채택한 애플사의 선택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감성 세대에 적중했다.
소비자는 이렇듯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아직도 기술에만 집중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국가 관점에서 기술의 유용성을 알아보자.
기술과 시장이 연계되어야 그 기술이 국가 성장으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시장이 없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
개발 프로세스에는 인풋(Input), 스루풋(Throughput), 아웃풋(Output)이라는 세 단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보통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스루풋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큰 변화는 기술에 대해 생각할 때 돈을 벌 수 있는지, 시장과 관계있는 지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는 기술의 시장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기술 시장은 IPO중심이지만 미국은 M&A중심이다.
즉, 미국은 투자 회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라나에서 1인 창조기업이 IPO까지 가려면 몇번을 파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작은 기업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 팔 수가 있다. 팔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엔젤과 벤처캐피탈이다.
우리나라의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돈만 투자하고 끝인데 반해, 대기업의 M&A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벤처캐피탈과 엔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의 벤처캐피탈과 엔젤은 기업에 팔릴 수 있는 기술정보를 주고 기업 성장을 배양한다.
생태계 통합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생태계 통합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다.
스루풋, 즉 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규명하고, 관련 제도를 통해 생태계 통합자 역할을 할 주체가 탄생한다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박방주 _
(이홍 교수에게 질문) 창조경제에서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많이 있나요? 관여를 많이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야 할까요?
이홍 _
정부가 생태계 통합자를 만들어줘야 한고 생각한다. 또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구글이 수년 동안 확보한 M&A 기술은 수백 개가 넘는다.
그렇게 M&A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흡수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상산 _
다산네트웍스에서 일할 때, 해외에 많은 개발 센터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도에 북한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10년간 다산네트웍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멘스가 대주주로 있었던 때에는 프로세스, 품질관리에 대해 새롭게 눈뜨기 시작했는데, 가장 크게 배운 건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었다.
세계시장에 나가보니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 시장이 있다는점을 알게 되었고 최적화된 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다.
해외연구소를 운영했던 곳으로는 단동, 상해, 연길, 첸나이, 뉴델리 등과 실리콘밸리가 있다.
지금 당장은 써먹을 수 없지만 시간을 들여 키우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단동과 하노이였다.
단순 작업,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심천, 연길 등의 조선족 인력이 효과적이었다.
스케일 면에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상해, 시안, 앙갈로 지역이 최적이었다.
인도에서는 원하는 스펙만 대면 2주 안에 필요한 인력을 모을 수 있었다.
첸나이나 뉴저지에 갔을때는 글로벌 기업과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아 국내에서 한번도 개발해 보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작은 벤처기업이었던 다산네트웍스가 중견기업으로 커갈 동안에 창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인력이 아니라 해외 인력 덕분이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해외 전문 인력 시장이 더 개방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
반 이상이 인도, 아시아인들이다. 우리나라도 해외 고급엔지니어들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다. 기술 개발에 기술자가 몇 명이나 투입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타 기업에 기술 개발을 의뢰할 때 단가에 인원 수 곱하고, 적정 이윤 더해서 나온 가격으로 기술 개발을 해달라고들 했다.
기술 개발에 있어 비용을 우선시 하는 사회 구조는 인재들의 이공계 진학을 가로막았으며, 정말 괜찮은 기술을 개발해 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집짓기에 비유하면, 벽돌을 빨리 쌓을 수 있는 벽돌공을 길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멋진 건축물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솔루션 기업치고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없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런 환경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아무리 주장해도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뛰어난 인재가 소프트웨어 업계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영명 _
2001년 우리나라의 ICT산업 생산규모는 152조 원 정도였다. 지난 10년 동안 1차 성장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2.5배 정도 성장한 396조원이 됐다.
이 중에서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유형은 95조 원 정도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창조경제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IT와 융합을 한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 자동차, 건설, 국방이다.
IT와의 융합 산업은 2013년에 60조 원, 2018년에 1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정보통신업계에서 예측하고 있다.
IT와 융합을 꾀하고 있는 조선업을 살펴보자. 조선산업에서 가장 큰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게 크루즈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크루즈선을 만들지 못한다. 왜일까? 사실은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고정 관념을 타파해야만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IT 강국이자, 조선업 강국이다. IT와 조선업을 융합해 크루즈선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각기 다른 산업의 상용기술과 상용기술이 합쳐진다면 전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에 있다.
오픈 마인드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업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 개발을 위해 인력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키워 놓으면 대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공계 교수들이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안식년을 맞은 교수들이 학교에서 혼자만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와서 실질적인 연구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도 기업 현장에 와서 연구에 참여한다면 부족한 연구 인력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전의식을 가진 기업과 학교가 서로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박방주 _
규제, 생태계 구축, 해외 인력 수급, 시장에 필요한 대학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시간에 발표된 내용들을 전부 실천한다면,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바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