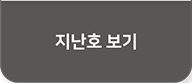Plus Essay - 나, 老木과 건물
1919년생 인생선배의 열정

두어 해 전, 젊은 시절 촉망받던 건축설계사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여 조용한 노후를 보내시는 아저씨를 인사차 찾았을 때의 일이다.
아저씨의 서너 칸 될 법한 방은 뜻밖에도 이젤과 완성, 미완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림들과 온갖 화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허름한 책장에 낡은 그림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방바닥에도 전 세계에서 구해온 듯한 미술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무엇보다도 액자 작업도 하지 않은 채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저씨의 작품들 - 고만 고만한 크기의 완성된 듯한, 또는 아직 더 붓길을 기다리는 듯한 유화, 수채화, 드로잉들 - 이 문외한인 조카 눈에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아니, 언제부터…?”
LA 사는 큰 아들과 사시는 동안 심심풀이로 붓을 잡으셨다는 소식은 듣고 있던 터였지만, 거기서 20년 넘게 편안히 사시다가 귀국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만큼 많은 작품을 만드셨는지 놀랄 일이었다.

식민지시절 일본유학 가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아저씨는 젊은 시절,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시내에 짭짤한 설계사무소를 가지고 꽤 바쁘게 일하셨다.
그 즈음에는 대학에 가끔 건축학 강의를 하러 나가기도 했었다.
건축설계하는 이들 가운데는 예술적 센스를 타고 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페인팅에 대한 꿈을 일찍부터 아니면 느지막하게라도 나름대로 키워보려고 애쓰는 경우를 주변에서 꽤 자주 듣고 보던 터였다.
하기는 건축설계도 그림의 한 장르라고 하지 않던가?
자연스레, 대화는 그림에서 그림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어졌다. 아저씨가 꺼내시는 화가와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귀와 입으로는 듣고 ‘네, 네’ 대답을 해 가면서도, 내 눈은 화집이 빼곡히 들어찬 책장으로 자꾸 쏠렸다.
책장에 어지럽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 포개져 있기도 한 화집 속의 그림들은 이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저씨의 응시와 숙고를 거쳐 한 장 한 장 그 자신의 세계로 환생하는 것만 같았다.
고전으로부터 인상파를 거쳐 Cubism을 따라 건물을 주제 삼아 여기에 자신을 끈질기게 동일시하는 작업에 몰입해 있는 것이었다.
연세 탓에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어느 독일계 현대 화가의, 건물을 주제로 삼은 특이한 표현주의 화풍에까지 화제가 미치자 ‘이제는’ 그런 그림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결의마저 보였다.
“파이닝어(Feininger)* 말씀이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처조카며느리가 풍월을 한답시고 거들고 나선다.
1919년생 제일고보 학생 김종식은 4학년이던 1936년, 까다롭기로 정평 난 미술선생님을 조른 끝에 간신히 허락받아 20호 크기의 유화 ‘거리풍경 - 인천 차이나타운’을 선전에 출품한다.
겁 없이 출품한 선전(鮮展)에 단번에 입선되면서 그림에 대한 평생의 집념이 싹을 틔운다.
다음해에는 바로 그 선생님이 아예 제쳐 놓았던 다른 그림 ‘정물(靜物)’을 선생님 허락도 없이 친구 이름을 빌려 다시 선전에 출품하고 재입선이 되었다. 그렇게 그림 그리기는 아저씨의 평생 내내 끊을 수 없는 꿈이 되고만 것이다.
지난해 봄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린 화동(花洞)화우회 정기전시회에는 국내에서는 75년만에 다시 선(?)보인 그의 그림 두어 점 중에 ‘나, 노목(老木)과 건물’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동문 아마추어 원로화가들의 모임의 간사는 전시회 도록 교정판을 펴는 순간 “와 -” 하는 탄성을 참을 수 없었노라고 찬탄해 마지않는다.
이번에 처음 출품했다는 80대의 다른 동우회원 한 사람도 자기 그림을 보여주려고 어느 전문평론가에게 전시회 도록을 보냈더니, 한 점 한 점 모두 프로 못지않은 개성 있는 작품이었다면서, 그중에서도 김화백 그림이 유난히 인상적이더라는 고마운 코멘트를 전해오기도 한다.
90세 넘는 일생을 풍상을 겪은 노목(老木)으로, 시대를 거쳐 온 낡은 건물로 승화시켜 낸 회상(回想)의 실루엣.
“제가 찾아 볼게요. 미국 가는 길에 꼭 구해 오겠습니다.”
파이닝어의 그림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나서 그런 그림에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의 화집(畵集)을 구할 길이 없다며 아쉬워하시는 아저씨의 말씀에,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선뜻 약속을 한 것이 그만 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국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찾을 방도가 없다는 파이닝어 화집이라지만, 미국이라면 웬만한 화가들의 화집은 구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파이닝어 화집을 보고 싶어하는 인생선배의 작은 소망 하나 들어 드리는 게 뭐 어려울까 싶었던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찌 된 셈인지 뉴욕 한복판의 세계적인 미술관 여러 곳, 제일 크다는 책방들, 심지어는 인터넷 시장을 여기저기 다 뒤져도 1천불이 넘는 개인전집만 나와 있을뿐, 내 형편에 손에 넣을만한 한 권짜리 화집은 구할 길이 없었다.
결국, 50년대 초 뉴욕에서의 그의 마지막 전시회 카탈로그, 그것도 고물상이 내놓은, 엽서 서너 장 붙여놓은 듯한, 군데군데 연필낙서를 겨우 지워놓은, 화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흑백 팜플렛 한 점을 인터넷에서 거금(?) 20불에 달랑 사 들고는 다시 찾아 뵌 게 얼마 전이었다.
“역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람 그림은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한번 흉내(?)는 내 봐야지.”
벼르는 노화백의 결의에 찬 표정엔 싱싱한 엔도르핀이 흠뻑 넘쳐나고 있었다.

흉내가 아니었다. 그는 해냈다.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한 69 x 53 cm 의 아크릴 그림 한 점. 그러나 90을 훌쩍 넘긴 연륜이라야 가능할 법한 소박하지만 힘찬 열정의 응축.
청동기(靑銅期) - 그는 지금도 그리고 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릴 것이다, 은혜로운 삶의 불꽃이 다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