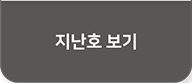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테크노리더십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R&D 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클 것이다.
Fast Follower 전략을 구사할 때는 앞선 기업들의 전략을 모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사정과 위상이 달라지면서 모방하고 뒤따를 대상도 사라졌다.
결국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미래를 전망하고 개척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R&D기획은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기술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경영은 안개를 뚫고 앞을 밝히는 전조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극복에 지름길은 없다.
본류에 충실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째, 미래시장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행기술 투자를 해야 한다. 한 번에 성공하는 소위 ‘대박’ 아이템은 없다. Big Business는 수많은 Small Business가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 반도체의 효자종목인 플래시메모리의 경우,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선행기술 투자를 해왔다. 선행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둘째,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술과 진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만, 그 시기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때에는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제품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CTO를 역임하는 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다. 이중 플래시메모리 사업의 기반이 된 선행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핵심인력의 확보, 성공의 첫걸음
삼성이 D램 사업에 뛰어든 것은 1983년이다. 1977년 애플2의 발표 이후 개인용 컴퓨터(PC)의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었다.
당시 메모리 시장은 64k D램을 양산하고 256k D램의 개발에 성공한 일본이 석권하고 있었다.
반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인텔 등의 미국 업체들은 일본의 파상공세에 밀려, 메모리사업에서 손을 떼고, CPU 등으로 주력사업을 옮겨가는 중이었다.
바로 이 무렵인 1984년에 삼성은 미국에 반도체메모리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 확보에 착수했다.
당시 미국 업체들이 메모리사업에서 철수하면서 D램 관련 엔지니어들이 많이 퇴직한 상태였는데, 삼성은 이들 인력을 흡수해 기술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는 호기를 얻게 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연구소에는 박사 2~3년차들을 연수생으로 대거 파견했는데, 이때 기술을 습득한 인력들이 이후 반도체사업을 이끄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반도체사업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핵심 기술인력 육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재들을 선별해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당시 환경을 적절히 이용해 퇴직한 선진인력을 흡수한 것도 성공 포인트라 할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대거 방출된다. 이때야말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메모리반도체는 D램을 비롯해 용량이 작고 속도가 빠른 S램, 그리고 통칭 NVM으로 불리는 비휘발성메모리(Non-Volatile-Memory) 등 크게 3가지가 사용되고 있었다.
비휘발성메모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외선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의 EPROM(Erasable PROM)이었고, 바로 뒤이어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이 선보였다.
이 EEPROM이 진화하여 현재의 플래시메모리가 되었다.
초기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는 재미과학자인 이일복 박사가 책임자로 이끌고 있었는데, 필자는 이 박사의 지시로 EEPROM의 개발을 맡게 되었다.
미국 벤처회사로부터 16kb EEPROM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EEPROM의 시장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향후 니치마켓을 노린 포석이었다.
EEPROM 연구에 매달린 지 만 1년, 마침내 64kb 메모리 설계에 성공해 귀국길에 올랐다. 이 때가 1985년 말이었다. 직접 메모리를 설계해본 경험은 이후 관리자로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큰 자산이 되었다.
엔지니어도 사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귀국 후 10여 명으로 팀을 꾸리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운이 따랐는지 256kb EEPROM개발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었다. 당시 EEPROM은 프린터와 저울, 팩스 등에 사용기록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개당 가격이 1~2달러에 불과한데다, 주로 산업용 기계에 사용되어서 시장규모가 매우 작았다.
1990년에 3,0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을 뿐이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여를 온갖 고생을 했지만, 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었다.
크게 좌절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조사팀으로부터 mask ROM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mask ROM은 닌텐도 게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인 샤프가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한국과 대만 등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복제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롬팩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는 정보였다.
당장 mask ROM 개발에 착수했다. mask ROM은 5V 전압을 사용하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했다. 20V에 구조도 복잡한 EEPROM 개발 경험이 있었기에 mask ROM 개발은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시범적으로 16Mb 마스크롬을 개발했는데, 주문이 폭주했다. 3년 만에 4억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이때의 경험은 큰 충격이었고, 또한 큰 약이 됐다. 기술은 사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확인한 것이다.
mask ROM은 이후 HP 프린터에도 채택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기술개발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적어도 팀장급 정도가 되면 팀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팀 스스로가 하나의 사업체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선행연구, Big Business로 우뚝
mask ROM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EEPROM은 더욱 큰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89년 EEPROM 연구에 한창 몰두하면서 관련 논문을 모두 섭렵하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견했다. 바로 도시바가 발표한 Nand EEPROM이 그것이다.
EEPROM은 데이터를 지우고 기록할 수 있었으나 용량의 한계 때문에 활용범위가 한정적이었는데, 도시바의 새 기술은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미 EEPROM 개발에 성공한지라, 기술적으로는 자신있었다. 바로 프로토타입에 도전했고, 성공을 거뒀다.
도시바와의 특허권이 걸림돌이었지만 행운이 따랐다. 당시 도시바는 삼성과 친밀한 관계인데다 히다치, 샌디스크와 기술경쟁을 하던 중이었기에, 시장에서 우군을 늘린다는 계산으로 삼성의 Nand EEPROM 협력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시장도 형성되지 않은 Nand EEPROM에 공을 기울인 것은 미래에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 가전연구소를 방문해서 우연히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 녹음기의 시제품을 접하게 됐는데, 디지털카메라에 커다란 플로피 디스켓을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스토리지(저장장치)의 소형화가 큰 화두가 될 것임을 느꼈다.
만약 반도체메모리를 데이터 저장장치로 쓸 수 있다면, 디지털 기기에 일대 혁신이 일 것이었다. 무릎을 쳤다. 용량 확장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지우고 쓸 수 있는 Nand EEPROM이야말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로 열리지는 않았다. 1994년 말 16Mb Nand EEPROM을 출시했으나 환영받지 못했다. 또 한번의 시련이었다.
고민 끝에 16Mb를 4분의 1로 쪼개서 4Mb 메모리를 디지털 자동응답기(Answering Machine)용으로 출시했다. 대성공이었다. 여기에 우리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Nand EEPROM의 용량 한계도 극복했다. 기술적으로 도시바를 앞지른 것이다.
이후 낸드플래시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다. 첫해 1,000만 달러로 시작해서 해마다 두 배씩 실적이 급성장하더니 2000년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는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삼성의 효자종목이 되었다.
초기 디지털 자동응답기에 국한되어있던 시장은 보이스팬,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으로 확대되더니 스마트폰에 이르러 Big Business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시장과 타협하며 점차 시장을 키워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CTO와 CEO의 역할이다. 조바심을 내며 포기했다면 결코 현재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리더는 조직과 조직원을 책임져야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R&D에서 리더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는 기술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과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당장 통할 제품과 기술은 물론이고, 5~10년의 미래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미래에는 이공계 출신 CE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믿는 이유다.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개발(Development)과 연구(Research) 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발에만 전념할 뿐, 선행연구는 시작도 안하고 있다. 이는 미래 우리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큰 한계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위해 PR(Pioneer Research) → PP(Proof Project) → TD(Technology Development)의 단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선행연구를 대기업 혹은 대학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PR은 씨앗기술을 찾는 것으로 1~2명의 소수인원으로도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철학에 달려있는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연구소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첫 번째, 연구소에 벤처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벤처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팀원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시절 각 연구책임자들에게 각 연구테마를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지시했었다. 자신들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분야에 쓰일 것이며, 또한 이것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분석하도록 한 것이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팀은 사업부와 끊임없이 소통했고, 자연히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됐다.
두 번째, 연구원들의 커리어를 관리해줘야 한다. 연구소는 업무특성상 정체되기 쉽다. 반면에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한다. 자칫 방심하면 트렌드에 뒤쳐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미 죽어버린 기술에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는 이들을 적지 않게 봤다. 이는 조직에 큰 손해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GE와 지멘스의 경우 우수한 인재의 경우 2~3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운영한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연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인재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다.
사람이 흐르고 생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 또한 리더의 책임인 것이다.